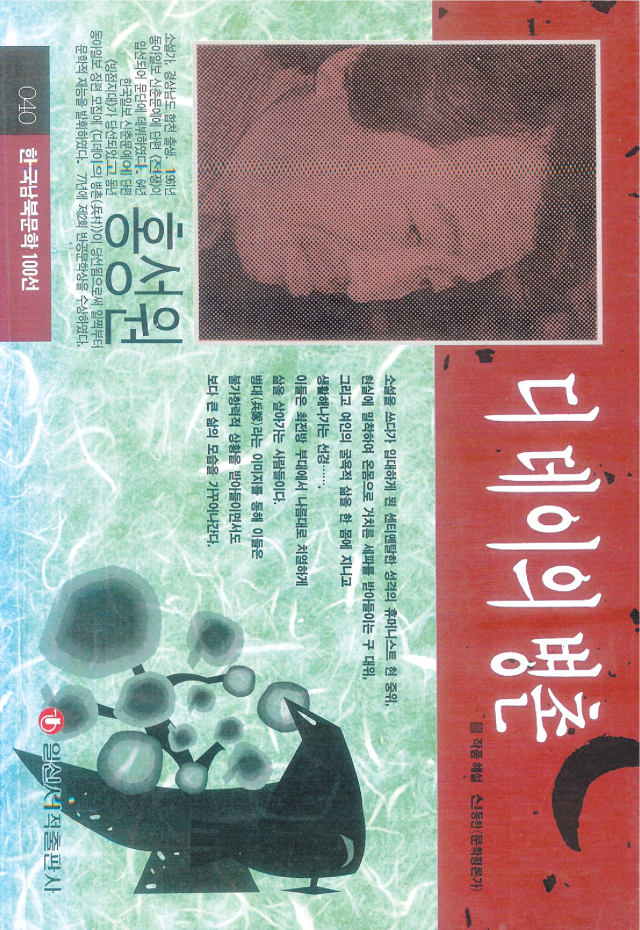
홍성원이 펴낸 장편소설 ‘디데이의 병촌’은 6·25전쟁 이후 강원도 전방부대를 배경으로, 휴전선 근처의 한 병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전쟁의 상흔과 인간의 본성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 실존과 윤리적 갈등을 탐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소설은 홍성원이 1961~1964년 철원(백골부대 근무)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빙점지대’를 쓰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1964년 12월 동아일보 50만원 고료 장편 모집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 소설은 배경이 되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지만 그의 군 복무 경력이나 DMZ(비무장지대)에 대한 언급, 쌍봉낙타 모양을 한 ‘낙타고지’ 등이 OP(관측소) 반대편에 보이는 설정 등으로 볼 때, 소설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참조한 지역은 철원으로 특정할 수 있을 듯 하다.
주인공은 정훈장교 현경식 중위. 현 중위는 소설가를 꿈꾸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전쟁의 참혹한 기억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소설은 그가 전방부대로 전입오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현 중위는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이기심을 목격하며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과부촌에 사는 아름답지만, 큰 아픔을 품고 사는 여인 선경과 가까워지면서부터다.
선경은 남편을 잃고 딸 민혜을 홀로 키우는 전쟁 미망인이다. 소설 초반 하숙집 주인이자 감리교 목사의 며느리로 등장하는 그는 딸 민혜를 위해 헌신적인 모성애를 보여주며, 현 중위에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나온다.
하지만 마을에 번진 콜레라로 선경의 딸 민혜가 죽게 되면서 둘의 사이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게다가 부대까지 옮기게 되면서 현 중위는 선경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 중위는 선경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디데이(D-Day)에 맞춰 부대원들과 이동한다.
하지만 때마침 홍수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현 중위는 선경이 목숨을 잃었다는 암담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슬픔 속에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현 중위는 기적처럼 선경과 재회하게 된다. 그렇게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피어오른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소설은 해피 엔딩으로 매조지된다.
소설은 현 중위가 병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현 중위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 노력하며,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현 중위는 단순한 소설 속 주인공을 넘어, 전쟁 이후 한국 사회 지식인들의 고뇌와 방황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현 중위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소설 전반에 흐르는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홍성원은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현 중위는 선경과의 사랑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선경과 재회하는 장면은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폐허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장편소설 ‘디데이의 병촌’은 전쟁의 상흔,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 사회 비판, 그리고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 등 다층적인 주제 의식을 담은 수작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025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며 소설을 읽은 이들에게 삶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사유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