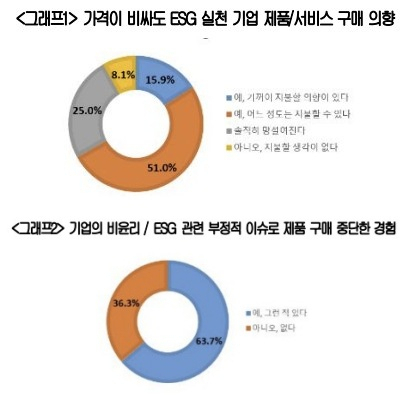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전국의 축산 농가가 걱정이다. ASF는 사람을 포함해 멧돼짓과 이외 동물은 감염되지 않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100%라고 한다. 동물의 침·분비물·분변 등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균 매개체는 바이러스를 가진 물렁진드기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9월26일 인천 강화도 서쪽에 자리한 석모도의 ASF 확진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병 공식에 맞지 않아 당국이 당황하고 있다. 병원균이 돼지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되지만 외부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의 해당 농장에는 축산 차량이 다녀간 사실도 없고 북한과 접경지역을 따라 흐르는 임진강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태풍 때 북한에서 멧돼지 사체가 남쪽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ASF 병원균 매개체에서 독수리와 까마귀를 제외한 이유를 필자는 알 수가 없다. 무더운 여름철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은 고라니와 멧돼지를 잡으면 운반하기 힘들고 맛도 없기에 산에 버리기 일쑤다. 버려진 동물의 사체는 독수리와 까마귀의 먹이가 되곤 한다. 특히 까마귀는 동물성에 가까운 잡식성이어서 북한에서 ASF로 죽은 멧돼지를 먹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 죽은 멧돼지 사체를 뜯어 먹은 독수리와 까마귀 등이 병원균을 보유한 채 남한의 축산 농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까마귀와 독수리는 이동경로가 넓어 축산농가에서 사료도 먹고 배설물을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SF 감역경로를 축산차량과 야생멧돼지로 한정하는 것은 방역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독수리와 까마귀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해 우리나라 축산 농가 전역에 ASF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에 까마귀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여름철에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산에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