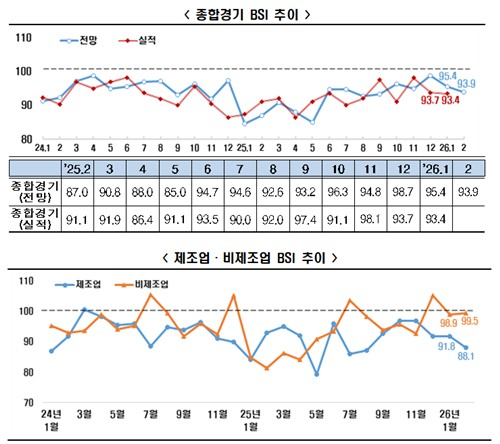근래 춘천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주요 사거리와 교차로, 건널목 인근까지 점령하듯 내걸린 거친 현수막들. 이는 더 이상 의사 표현이나 홍보 수단을 넘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주는 실정이었다. 한편으로는 도시의 품격, 정치권을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무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더더욱 심각하다.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아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닐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살벌한 언어와 감정, 태도. 거친 표현과 자극적인 문구가 아무런 제어 없이 거리로 쏟아지는 풍경은 기성세대가 결코 남의 일인 양 넘길 수 없는 장면들이다.
필자는 도시 행정의 역할을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 그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현수막 문제 역시 우리가 어떤 도시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춘천시는 이 문제를 단기적인 정비나 일회성 단속만으로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 철거나, 과태료 등의 방식만으로는 문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관리 방식, 도시를 대하는 마음 자체를 바꾸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현수막을 유형별로 나누고, 발생 원인과 게시 주체에 맞게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생업과 연결된 현수막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외면하지 않되, 그 방식조차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상식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 안에서 다듬으려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현수막 없는 거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무관용 원칙을 통해 도시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정치 현수막 문제도 마찬가지. 법에 따라 보장받는 기득권을 넘어, 정당과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이끌고자 한다. 대화와 합의 없이 만들어진 질서는 쉬 부러진다. 그러나 서로가 동의한 약속은 도시의 문화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을 꾸려가며 늘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이 결정이 시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가?” 현수막 문제 역시 그 질문에서 출발했다.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등 주요 구간을 집중 정비한 이후, 시민들께서 보행이 한결 편해졌다, 거리가 정돈되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다. 변화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일상의 체감은 분명하다.
현행법 안에서 허용되는 일부 현수막들의 존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춘천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합법과 무질서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고자 한다.
현수막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도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을 지키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공공의 공간을 먼저 생각할 때, 춘천은 현수막 문화에서도 전국 최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아름답고, 멋진 변화는 단지 현수막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