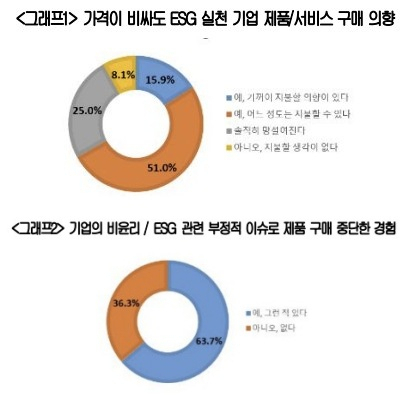필자는 춘천에서 경북 영주를 다녀온 적이 있다. 춘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 필자의 시야에 들어온 좌우측 산야의 붉은 고사목들의 모습은 마치 가을 단풍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고사목이었다. 재선충에 감염돼 죽은 것이다.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나무조직 내부로 침입해 빠르게 증식하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나무를 시들게 하고 결국 말라죽게 만든다고 한다.
필자의 농장 옆 산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세 그루 있다. 어느 날 그중 한 그루의 잎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다. 주변에 죽은 소나무가 없어 처음에는 재선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심이 들어 시에 신고하니 관계자가 나와 시료를 채취해 갔다. 이후 결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다. 궁금한 마음에 전화해보니 그제야 재선충 감염이 맞다는 것이다.
남은 두 그루도 감염 우려가 염려돼 빠른 조치를 요구했으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돌아온 답변은 ‘나무가 너무 커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알기로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은 베어내어 훈증 소각하고, 매개충 구제를 위해 5~8월 중 약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죽은 고사목은 방치된 상태고, 남은 두 그루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기대 효과는 미비한 상태다. 이미 방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본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야의 멋스러움을 자랑하던 낙락장송의 위용은 머지않아 옛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애국가 2절에도 언급되었듯이,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곁에 가장 친숙한 나무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의 소나무가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소나무는 8종 정도다. 리기다소나무, 백송, 금강송(황장목), 흑송(곰솔·해송), 처진소나무(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류송(柳松)’이라 불리기도 한다), 반송, 은송, 황금소나무 등이다.
이 중 금강송은 예로부터 건축재로 사랑받아온 소나무로, 사찰·고궁·궁궐 등에 건축재로 사용돼왔다. 특히 황금소나무는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아름다운 자연조화를 이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다.
이러한 금강송과 황금소나무의 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움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재선충 악재로 인해 그 존재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방제 시스템의 미흡함도 소나무 보존에 허술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울진·영덕·청송 산불 당시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소방헬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실어 날랐던 일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가 귀한 이유는 나뭇결이 곱고, 나이테 간격이 좁아 강도가 높으며, 뒤틀림이 적고, 벌레에 강하고며 송진이 있어 습기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다.
또한 솔잎은 예부터 약재로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추석에는 떡시루에 깔아 송편을 쪘다. 토속주를 빚을 때에도 솔잎을 함께 넣었다. 이렇듯 소나무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마다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향후 100년 안에 우리 산야에서 침엽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었다. 그 예측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상기후는 우리의 바람을 저버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 후세들은 수목도감에서나 소나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올 추석은 솔잎을 깔아 쪄 주시던 어머니의 송편이 유난히 그리워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