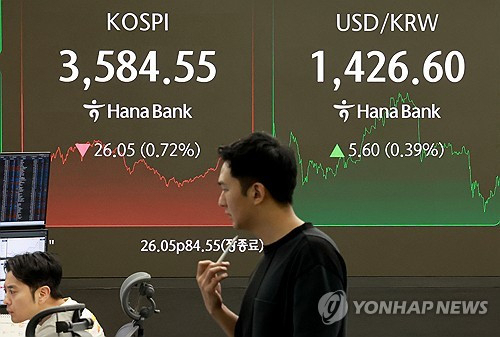올해는 북한의 제2땅굴이 발견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1975년 3월 24일, 철원에서 발견된 제2땅굴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다. 군 당국이 “전차도 통과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힌 이 땅굴은 유사시 북한군 병력 1만6,000여 명이 한 시간 내 침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깊은 충격과 함께 안보 불안을 실감하게 됐다. 땅굴은 적의 후방으로 은밀히 침투하거나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뚫는 군사적 수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침용 땅굴을 조직적으로 파왔다. 남측에서 발견된 땅굴들은 모두 병력과 중장비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으며, 발견 당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탐지와 봉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북한 땅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74년 11월 15일이다.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동북쪽 약 8km 지점에서 제1땅굴이 발견됐다.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1.2km 지점에서 포착된 이 땅굴은 폭 1m, 높이 1.2m, 지하 약 45m 깊이에 위치해 있었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폭약과 송풍장치 등을 확인하고 즉각 남침용으로 판단, 긴급 봉쇄에 나섰다.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북 경계 태세가 강화됐다. 이듬해인 1975년 3월, 철원에서 제2땅굴이 발견됐다. 제1땅굴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콘크리트로 보강된 벽면과 탄약고, 사격용 통로까지 갖춰져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군은 즉각 폭파 봉쇄 작업과 함께 DMZ 일대 탐지 작업을 확대했고, 정부는 국민 대상 안보 교육과 대피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1978년에는 제3땅굴이 발견되며 국민적 충격이 다시 한 번 거세게 일었다. 발견 시점은 1978년 10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약 4km 지점이었다. 군은 “병력 3만 명이 한 시간 내 통과할 수 있다”며 남침용 땅굴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서울까지 직선 거리로 52km밖에 되지 않는 전략적 위치에서 발견된 만큼 수도권 방어 태세가 전면 재정비됐다. 제3땅굴 발견 직후인 1978년 11월3일. 사진과 같이 춘천공설운동장에서는 땅굴 규탄대회가 열렸다. 도민 수천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침투 야욕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고,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낭독됐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역사회 전체가 국가 안보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1990년 3월 3일에는 강원도 양구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제4땅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땅굴은 동부전선을 통한 남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랜 기간 은밀하게 지하 침투를 준비해왔음이 명백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군과 정부는 전국적인 땅굴 탐지 작업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비대칭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 침투 방식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 것 또한 현실이다.1978년 춘천공설운동장을 가득 메웠던 도민들의 결연함은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한 시대를 관통했던 굳건한 안보 의식은 오늘의 우리에게 ‘과거가 남긴 지혜’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군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했던 안보라는 이름의 자산을 빛바랜 사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