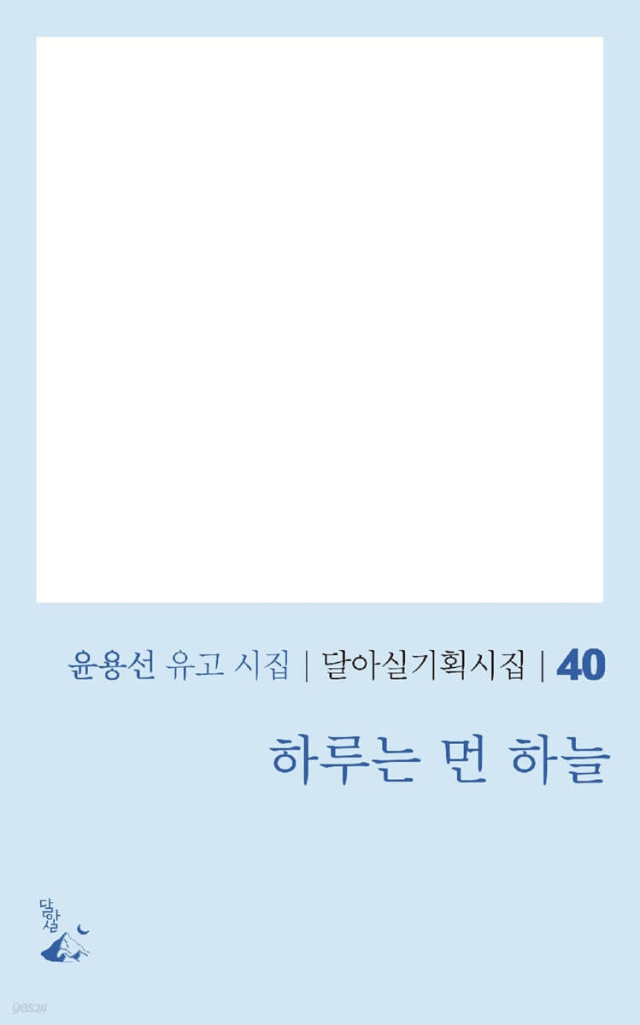
한 사람의 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 어디로 흐르는가. 시인 윤용선의 유고시집 ‘하루는 먼 하늘’은 그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자, 생을 시로 살아낸 한 시인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작고 2주기를 앞두고 상재된 시집은 시인의 전 생애적 시선을 담아냈다. 삶과 자연, 관계와 죽음, 그리고 시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흐른다.
윤용선의 시는 한 번도 날카로운 언어를 동원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담담한 문장들은 날것의 감각을 살려내며, 독자를 끌어 들이는 힘을 지녔다. 흔히 시인들의 언어는 ‘저항’이나 ‘아픔의 기록’으로 읽히곤 한다. 하지만, 윤용선은 그 모든 감각을 끌어 안은 채, 자연에 기대 자신을 비워내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시 세계를 구축했다. 화려한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그의 시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시집의 1부(가시지 않는 허기)에서 시인은 풀꽃이고 나무이고 싶다고 말한다. 자리를 옮기지 않고, 불평도 없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그 단순한 존재방식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인간이라는 숙명을 감당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다. 윤용선 시의 본질은 여기서 출발한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리움, 아득한 공허와 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것은 개인적 감각이자 동시에 인간 보편의 운명이다.
시인은 2부(코스모스꽃 피면)과 4부(겨울끝 먼 풍경)를 통해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면의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눈발 사이를 푸득이며 날아오르는 작은 새의 이미지나, 얼음새꽃이라는 이름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은, 끝내 부서지지 않고 살아내는 존재의 존엄성을 품고 있다.

3부(하루는 먼 하늘)와 5부(참 머나먼 길이야)에서는 마침내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함께 응시한다. 특히 표제작 ‘하루는 먼 하늘’에서 시인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미 그 하루들이 먼 하늘로 흘러가고 있음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먼 하늘’은, 시인의 현재와 이미 지나간 시간, 그리고 남겨질 미래까지를 품은 상징적 장소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는 시인의 검허한 삶의 태도를 시 안에 선명하게 담아냈다.
이처럼 윤용선의 시 세계는 자신의 생과 문학적 삶을 통해 보여준 끊임없는 질문과 응시의 기록들이다. 그는 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연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이제 투명한 언어로 남아, 한 권의 시집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시인의 아내 김규희씨는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글들이 예쁘게 몸단장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며 “웃음 보일 당신을 그려보며 멋지게 산 당신의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달아실 刊. 156쪽. 1만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