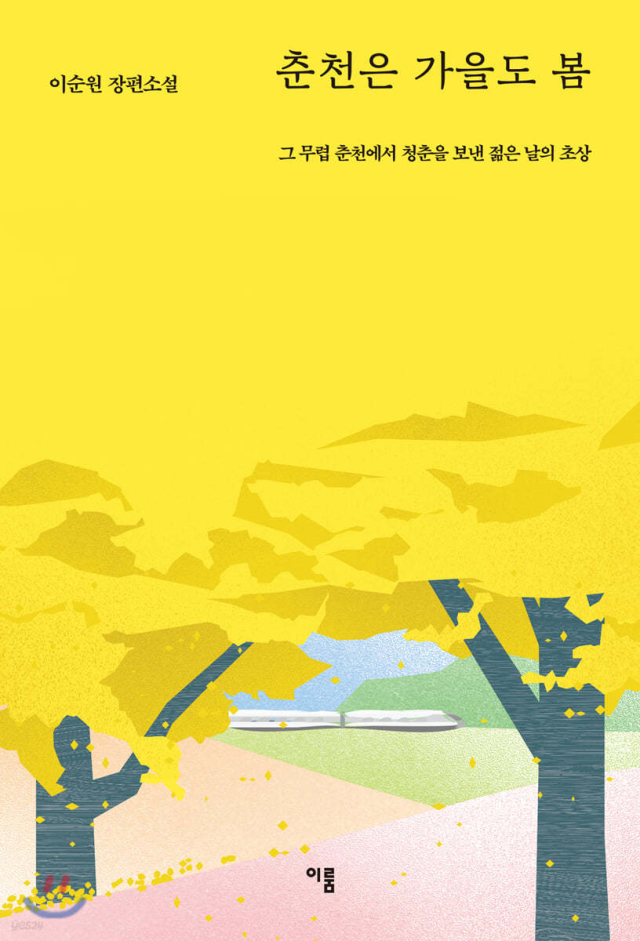
춘천의 시간은 계절과 무관하다. 여름날 호반에 이는 바람도, 겨울날 강촌을 덮는 눈도 모두 같은 기억의 ‘결’로 이어진다. 유안진 시인이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라 노래한 것처럼, 춘천의 청춘은 계절과 상관없이 피어나고 스러지기를 반복한다. 이순원의 장편소설 ‘춘천은 가을도 봄’은 그런 춘천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 안에서 방황하며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서정적 서사로 엮인다.
“이제 나는 이야기 한다”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1970년대 후반 춘천에서 청춘을 보낸 한 소설가의 회고담이다. 소설의 주인공 김진호는 유신 체제 속에서 대학 시위를 하다 제적당한 후, 다시 춘천으로 돌아와 두 번째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인물. 그의 눈에 비친 춘천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공지천에서 바라보는 저녁놀, 학보사에서 원고를 붙들고 씨름하던 시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이디오피아의집과 명동의 카페들은 모두 청춘의 한 조각이 된다.
춘천은 그의 청춘과 함께하고, 그 청춘이 지나간 자리마다 기억이 남는다. 대학가의 팔호광장, 육림고개, 요선터널을 따라 걸으며, 그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춘천이라는 공간은 그의 방황과 성장, 그리고 첫사랑과 이별의 무대가 된다. 청춘의 감각적인 기억들이 춘천의 풍경 속에 새겨지고, 한때 이 도시에서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추억과 겹쳐 보게 된다.
김진호가 춘천에서 만난 첫사랑 채주희는 이 소설의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다. 미군 부대가 있던 춘천에서 태어나 ‘튀기’라 불리던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채주희는 김진호와 함께 있을 때만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결국 사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운명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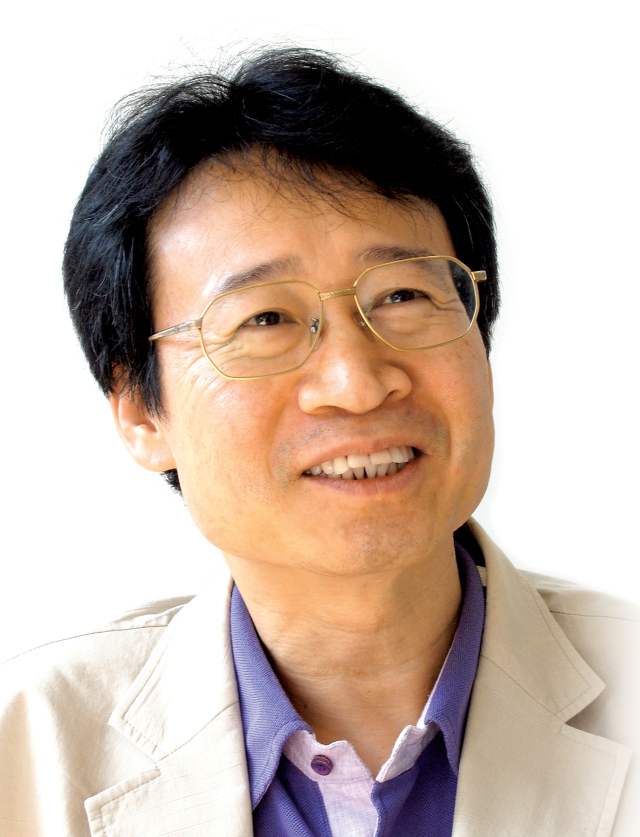
춘천은 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이자, 극복할 수 없는 경계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김진호는 채주희를 통해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되고, 그녀의 흔적을 좇으며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다. 결국, 춘천의 시간 속에서 그는 성장하고, 그녀는 떠나간다.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김진호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다.이순원의 ‘춘천은 가을도 봄’은 단순한 청춘소설이 아니다. 이 소설은 춘천이라는 공간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격동과 청춘들의 삶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를 보여준다. 김진호의 아버지는 유신 체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권력을 누리는 인물이고, 그의 당숙은 4·19 세대의 이상을 간직한 채 시대와 타협하지 못한 채 방황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격변하는 시대 속 개인의 위치를 고민하게 한다.
이순원의 문장은 마치 강물처럼 유려하게 흘러가며, 춘천의 풍경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특히, 당대 대학생들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한 장면들은 시대적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학보사 활동과 대학가의 시위 문화, 정치적 억압 속에서의 젊은이들의 고뇌가 춘천의 풍경과 함께 엮이며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특히 소설은 춘천에 대한 헌사이자, 그곳에서 젊음을 보낸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라고 하겠다. 유안진 시인의 시에서 제목을 빌려온 것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다. ‘춘천은 가을도 봄’이라는 말은, 계절과 상관없이 청춘의 순간은 언제나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순원의 소설은 그러한 청춘의 순간들을 포착해, 독자들에게 건넨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우리는 각자의 춘천을 떠올리게 된다. 그곳이 실제 춘천이든, 아니면 우리 기억 속 어느 계절의 한 순간이든 간에 말이다. ‘춘천은 가을도 봄’은 단순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춘의 자화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