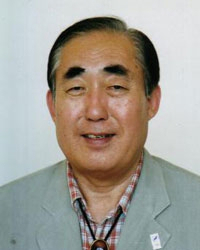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모두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던 빈대가 출몰(?)했다. 매스컴은 신기한 것을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초긴장이다. 보도를 접하면서 1960년대 초 군에 입대해 빈대, 이, 벼룩 등 흡혈 해충에 시달렸던 기억에 소름까지는 아니고 온몸이 스멀스멀해진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겪은 빈대, 이, 벼룩과의 원하지 않은 랑데부는 고된 훈련을 더욱 버겁게 했다. 소대 내무반의 복도 양쪽 침상에 40여명의 훈련병이 누우면 침상이 비좁다. 마룻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는 마대자루 같은 성근 천에 부실한 내용물이 담겨 있는 깔개로 빈대와 벼룩에게는 최상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 운신이 힘든 좁은 침상에 누우면 빈대와 벼룩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된다. 흡혈할 수 있는 거대한 먹잇감이 있으니까 한밤의 향연을 벌이게 된 것이다.
야행성의 빈대 등 흡혈 해충은 소등(消燈)한 내무반 침상이 최적의 활동 무대가 됐다. 빈대가 몸에 붙어 피를 빨아도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면 빈대가 매트리스 속으로 숨을까 봐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깨에 붙은 빈대를 잡았다. 엄지와 검지에 힘을 줘 빈대를 비벼 터뜨렸다. 그리고 살짝 냄새를 맡았다. 어디다 표현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로 인해 끌어오르는 매스꺼움을 참고 마른침을 목구멍으로 넘겨 어금니를 물었다. 빈대를 터뜨렸다는 조그만 쾌감보다 처음으로 맡은 악취로 인해 훈련에 지친 몸은 정신만 말똥해졌다.
온몸에 빈대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환각에 빠졌다. 훈련소 입소 후 시멘트 포대 종이에 사제(私製) 옷을 모두 벗어 고향으로 보낸다. 기간사병은 소포에 수신자 주소를 정확하게 쓰라고 강조한다. 전방부대 배속 첫휴가 때 어머니가 이르셨다. “너의 냄새가 밴 옷이며 신발을 보니까 섬뜩한 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셨다. 떠나신 지 삼십년이 넘었어도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그립다.
빈대 출몰로 나라가 떠들썩하자 대중교통 수단에 강력한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숙박업소에 위생점검을 하는 등 비교적 발빠른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빈대의 유입경로를 알아보고 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무슨 수로 어떻게 유입경로를 알아낼 수 있겠는가. 가정집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면 침대나 침구 등 구석구석을 찾고 헤집는다. 철저한 방역과 흡혈해충의 서식환경을 없애는 일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오늘에 살고 있는 유아, 청소년은 빈대, 이, 서캐, 벼룩의 실체를 모른다. 피를 빨아 먹는 해충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생활환경이 1960~1970년대에 비해 좋아졌고, 지구촌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지만 100% 수긍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몇 해 전에도 초등학교 어린이에게서 머릿니, 서캐가 발견됐다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 학부모와 당사자인 어린이가 죄인이 된 듯 숨을 죽인 해프닝이 있었다. 사소한 일에 침소봉대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그르칠 수 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은 숨어 있는 간첩 색출하듯 도내 초·중·고교에 일제 점검에 나서 흡혈충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실시, 빈대가 ‘빈대 붙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빈대는 밤을 좋아한다. 자신의 몸에 비해 6배나 되는 양의 피를 빨아 먹는 드라큘라가 꼬이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