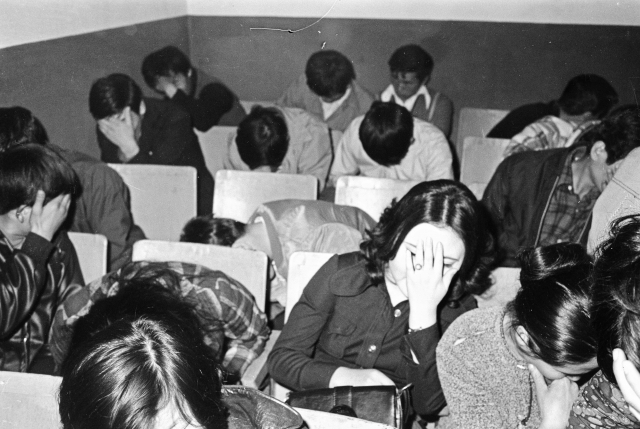
밤에는 누구도 다니지 말아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밤이 되면 일반인이 마음대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던 때다. 불과 40여년 전까지 그랬다.
제도가 유지됐던 것은 치안유지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권력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최소비용으로 비교적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은 제도였으니, 이를 포기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는 않았을 듯 하다. 그래서 통제의 수단으로 애용된 야간 통행금지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그 흔적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부터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태종실록에는 군무를 의논하던 관청인 삼군부가 왕(태종)에게 “이제부터 초경(初更) 3점(點) 이후 5경(更) 3점(點) 이전에 순라(巡邏·조선시대 순찰제도로 밤에 궁중과 도성둘레를 순시하는 것)를 범하는 자는 모두 가두게 하소서”라는 대목(태종실록 1권, 태종 1년(1401년) 5월 20일)이 나온다. 야간통행금지의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가 있고나서 그해 9월에 대사헌(大司憲) 이원(1368~1429)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고 집으로 가다 검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적발한 윤종이라는 이름의 순관이 이원의 몸종만을 잡았다 풀어주자 사간원이 나서 두 신하를 모두 파직할 것으로 요청하고, 왕이 이를 허락하는 일(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년) 9월 21일)까지 벌어진다. 또 단종실록에는 초경(初更·오후 7~9시)에 순작(巡綽·순찰하여 경계함)을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초경에만 순찰을 하고 나머지 경(이경~오경)에는 방울만 흔드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 매 경마다 순작해야 한다는 내용(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1452년) 6월 5일)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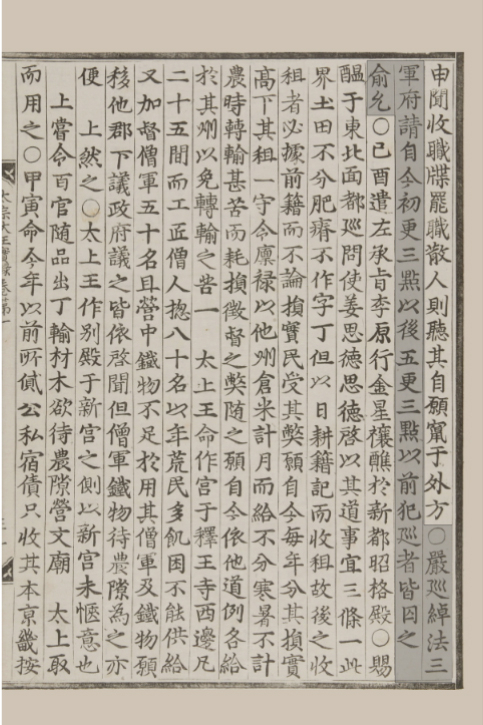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왕의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실록에는 성종이 풍양으로 거둥해 열병을 하고 사냥을 참관하는 등 이틀동안 촉박하게 일정을 소화할 것을 염려해 동지사 이극배(1421~1495)가 왕에게 아뢰는 장면이 나온다. 이극배는 성종이 늦게까지 사냥을 구경하고 범야(犯夜·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에 다님)해서 궁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럿이 수고롭다고 말하고, 이에 성종은 일정을 사흘로 연장하겠다(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1475년) 1월 8일 )고 밝힌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에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초경(오후 7~9시)에서 밤 10시 부터인 이경으로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문과 도성문의 개폐에 대한 규정인 병전 문개폐조(門開閉條)에는 “궁성문(宮城門)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에 열며, 도성문(都城門)은 인정(人定·밤 10시에 쇠북을 스물여덟 번 치던 일)에 닫고 파루(罷漏·새벽에 쇠북을 서른세 번 치던 일)에 연다”고 했다. 이어 궁궐과 도성의 순찰 등에 관한 규정인 병전 행순조(行巡條)에도 “이경 후부터 오경 이전까지는 대소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어졌으니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완화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엄격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들에 한해 야간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고종대에 이르러 인정·파루 제도가 폐지(1895년)되면서 야간통행 금지도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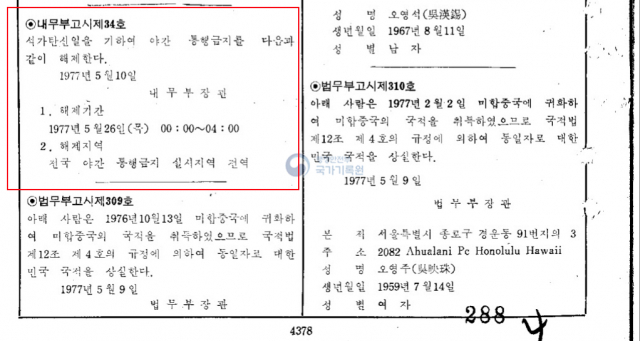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다시 부활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8.15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8일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진다. 곧이어 발발한 6.25 전쟁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지속되던 야간 통행금지는 ‘전시·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애매한 전제를 달고 1954년에 최초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그 처벌 규정이 아예 법제화 된다.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치는 것으로 벌(?)을 줬다면, 그래도 이때는 구류나 벌금 처분을 했으니, 그래도 ‘조선시대’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밤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이 야만의 시대를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레토릭에 속아주며 마치 순한 양처럼 용인하고 참아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댔고,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 처럼 여기 저기에 철제 바리케이트가 설치됐다. 어김없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고요한 밤의 적막을 깨는 주범이었다. 시간을 어겨 방범대원들에 걸리기라도 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치소에서 밤을 지새거나 벌금을 내야만 했다. 죄목은 ‘야간통행금지법위반’이었다. 심지어 연착으로 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도 야간 운항금지 조치에 걸려 예외없이 착륙도 못하고 회항해야만 했다. 특히 헤어지기 싫은, 사랑하는 남녀를 강제로 떼어 놓는 역할을 했으니 연인들에게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다. 그 기간 가수 배호의 ‘0시의 이별’이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이별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는 웃픈 내용은 전설로 남아있다. 그나마 크리스마스 이브나 석가탄신일,12월 31일에 한시적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으로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마침내 1981년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대한 내용이 국회 국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이듬해인 1982년 1월 휴전선 인접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에서 야간통행금지는 폐지 되기에 이른다. 시행 37년만의 일이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와 관련해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 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으니, 올림픽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되찾아 준 셈이다. 이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로소 ‘자율’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상쇄할 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야간 통행금지 폐지가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