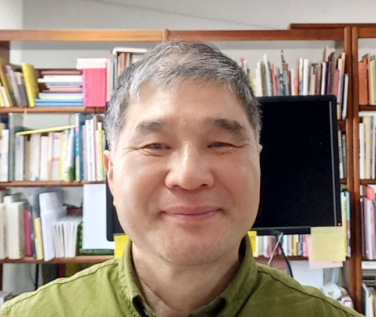최근 평창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에 다녀오면서 오가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늘 아래 산 뿐인 모습을 보고 강원의 산림 비중을 또 한 번 실감했다. 그러면서 이 숲은 우리 모두에게 맑은 공기와 물을 선물하는 자산이자 동시에 개발의 한계와 보전의 부담을 상징하는 현실임을 느꼈다.
도의 산림은 전체 면적의 81%, 국가 전체 산림의 21%를 차지한다. 전 국민이 숨 쉬는 다섯 번의 호흡 중 한 번은 강원의 숲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강원의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전국 상수원의 근간이 되는 맑은 물을 길러낸다. 게다가 대형 산불이나 집중 호우 때 피해를 완화하고 재난 확산을 늦추는 자연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건강한 숲은 불길의 속도를 늦추고, 빗물과 토사의 흐름을 조절해 피해를 줄여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숲을 지키고 가꾸는 부담은 여전히 도민의 몫이다. 도는 한강수계 면적의 62%를 차지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부분 지역에 겹겹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전체 면적의 17.4%(193.96㎢)가 환경·수질 관련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춘천과 도 전역은 국가의 수질과 생태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개발 제한을 감내하고 있다.
국가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숲과 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정당한 재정적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국민 1인당 1,000엔을 걷는 ‘산림환경세’를 도입했고, 스웨덴은 탄소세를 통해 환경보호와 복지를 함께 강화했다. 우리도 한강수계 상류의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환경서비스 환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산림과 하천을 비롯한 환경보전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과 주민에게 그에 걸맞은 금전적 보상을 사회가 환원하는 제도다. 춘천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와 산림·수질 복지 바우처 지급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금 사용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숲 없이는 대한민국의 숨도 없다”는 인식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구체적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
강원의 숲과 물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자원이 아니다. 국가의 생명줄이며 그 공익적 가치는 재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교부세 산정에 산림 면적과 상수원 보호율, 산불 위험도를 반영하고 ‘산림환경세’ 또는 ‘산소세’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관리와 보전, 활용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온전히 이양받아야 한다. 그래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의미의 ‘산림자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강원의 숲은 도민에게는 희생의 무게이자 대한민국에는 숨의 원천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