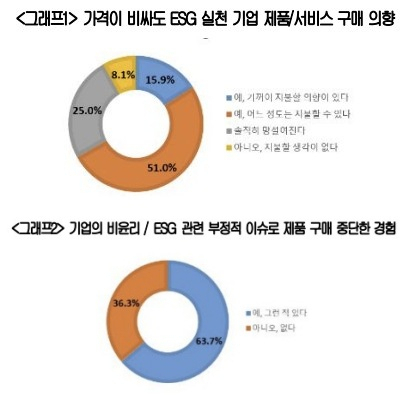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철도는 나라의 강철동맥”
1862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륙횡단철도 건설에 서명하며 했던 말이다. 160여년 전 격언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철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과 물류를 정확한 시간에 가장 많이, 빠르게, 안전하게 수송해 가장 파급효과가 큰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몰아친 26일 오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취재진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1공구(춘천시 근화동~신북읍) 공사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춘천~속초 전 구간(8개 공구) 착공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춘천시 우두동 현장에 도착하자 깊이 62m, 직경 18m의 지하 수직 터널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재난 영화의 싱크홀을 떠올리게 한 이 터널은 지하철도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 대피와 연기를 배출하는 초대형 환기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분간 수직 터널을 내려가자 지하 깊은 곳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에 한창이었다. 터널을 팔 때 마다 생긴 나이테 같은 무늬가 수천여개 겹쳐 현장 관계자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역사(大役事·대규모 토목공사)의 장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환기구에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다. 환기구를 통해 길이 130m의 ‘그리퍼 TBM’이 투입된다. 원통형 회전식 터널 굴진기인 TBM은 지하터널 5.3㎞를 뚫는다. 현장 사무실에서 모형을 통해 확인한 그리퍼는 전면의 수많은 손·발로 암반을 강하게 고정한 후 드릴로 전진하는 장비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이 장비는 국내에서는 투입 자체가 이례적인 첨단 공법이다.

춘천시 근화동 스카이워크 인근에서는 강원지역 최초의 하저(河底)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의암호 수면 위를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도로 형태의 임시 구조물인 ‘가물막이’를 만들고 있다. 흙을 쌓아 만든 물막이 양옆으로 튜브를 설치한 뒤 흙을 파내 강밑에 길이 995m 터널을 만드는 어려운 공사다. 한강 밑을 통과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동일한 방식이다.
지하와 수중을 통과하는 춘천 1공구는 동서고속철도 전체 93.7㎞ 구간 중 최고난이도 구간이다. 1987년 처음 추진돼 정확히 40년만인 2027년 개통하는 동서고속철도의 역사와 역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간이기도 하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역을 거치는 동서고속철도는 춘천을 기준으로 화천까지 8분, 양구까지 15분, 인제까지 23분, 백담역까지 30분, 속초까지는 39분이 소요된다.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는 99분만에 연결된다.
김진태 지사는 “의암호 하저터널 공사 난도가 어려운 만큼, 안전하고 빈틈없는 공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철저한 공정관리 지원으로 2027년 적기 개통해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