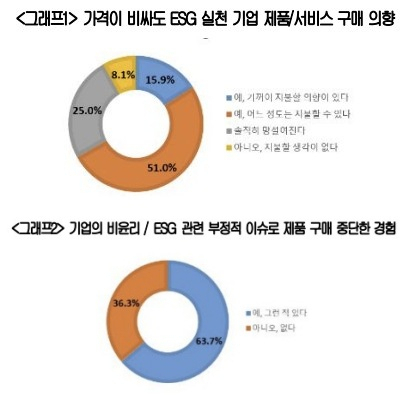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 돈이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직장과 상이한 부과방식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비중이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2018년 7월,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는 재산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소득정률제를 시행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의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 신청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은 소득발생 요소별 근거와 사실을 기초로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해 직역 간 부담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올 11월이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소득 보험료 정산제도’는 휴·폐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확정 소득으로 조정한 보험료를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된 소득자료를 연계받아 부과해 실제 소득 발생과 최대 2년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이 입증되면 보험료를 조정했다. 기존 조정제도는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의 경우 해촉증명서로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피부양자 등재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해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를 통해 사후에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원화된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이를 계기로 공정과 소득중심에 기반을 둔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정립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은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 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제공 등 수준 높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위해 국민이 기대하는 공단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수용성 및 재정 안정성을 더욱 높여 건실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