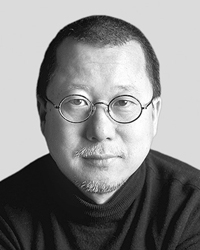
강가에서 주워온 돌 하나가 책상 위에서 가만히 흐느끼고 있다. 그대는 듣는가, 책상 위에서 돌이 혼자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나는 새를 쏘았던가? 저 돌은 내가 쏘아 떨어뜨린 새인가? 지난여름 초목을 태울 듯 하던 불꽃 더위가 잦아들고 소슬한 바람이 분다. 복숭아를 좋아하던 용접공은 연애에 빠지고, 줄장미가 붉은 꽃을 피웠던 여름은 지나갔다. 나이 어린 이모가 시골집 뒷곁에서 석류나무에서 몰래 딴 석류를 먹는 계절이 온다. 한때 번성하던 것은 시들고 바스라지며 우리에겐 관조의 시간이 배달되는 것이다. 가을 저녁엔 후박나무 잎사귀가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슬그머니 놓치고 제 풀에 내려앉는다. 저렇듯 땅으로 하강하는 조용한 시간이여, 나는 유랑의 무리와 그 속에 고립된 나를 가만히 돌아보련다.
봄엔 산등성이 비탈밭에 심은 사과나무 700그루에 퇴비를 주고 농약을 치고, 늦가을엔 마가목 열매를 따서 설탕을 쏟아부어 과실주를 담그려고 했다. 동지 때면 호롱불 아래서 권정생의 동화책이나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작은 꿈들은 산산이 깨졌다. 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농협 빚만 늘었다고 울분을 토해내던 영농후계자들이 서울에서 넥타이를 매고 다단계 회사에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름내 식빵을 한 조각씩 떼어 입에 넣으며 '성문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을 붙들고 있었지만 학업은 고만고만했다. 술에 취하면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불러 제끼고, 나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해 변호사를 하겠다던 이종사촌은 모의고사를 망치더니 거제도에 내려가 용접공이 되거나 원양어선을 탈거라고 떠들어 댔다. 나 역시 대학입시를 엎고 정음사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전권이나 독파하기로 결심하고 풋풋한 눈썹을 밀고 토방에 들어갔다.
가을이 오니, 온갖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른다. 내가 열아홉일 때 대수학과 절대음감은 언감생심이었으니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시중 은행에 들어가 창구 직원으로 일하다가 감리교회의 신자 아가씨와 눈이 맞아 조촐한 살림을 꾸리며 1남 2녀를 기르며 살고 싶었다. 내가 진학한 상업고교에는 소설을 잘 쓰는 최재섭과 제홍만이 선배로 버티고 있었다. 한때 문학도였던 이들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제홍만은 소설은 진작에 작파했다고 했다. 그는 날마다 영어단어 50개씩을 외우며 전액 장학금을 받더니 졸업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곧 외환은행에 특채되었다. 훗날 그가 우수행원에 뽑혀 마드리드지점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재섭은 서울시청 앞 백남빌딩에 있던 대한항공을 다녔는데, 그는 자주 가난한 후배와 함께 명동의 카페 떼아뜨르에 가서 연극을 보았다. 명지대학 야간부 영문학과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난 그를 다시 만난 건 16년 뒤 뉴욕에서다. 1991년이던가? 미국 굴지의 보험회사 부사장으로 입신양명의 꿈을 이룬 그가 뉴욕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에 난 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인생에는 꽃향기와 행운, 실패와 배신, 비탈과 암초가 따른다. 나는 들국화 더미 같이 살뜰하게 살진 못했다. 스물넷에 신춘문예에 당선한 뒤 시집 몇 권을 내고, 출판사 창업을 했다. 감리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참한 처녀와 결혼도 하고, 여뀌같이 어여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식솔로 건사하며 가장 노릇을 해냈다. 그 일을 믿기 힘들 정도로 능란하게 해냈다. 뒤늦게 수영을 배우고 근육을 키웠다. 아이들 셋은 백화점 문화센터의 수영 강습반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게 했다. 서울 하계올림픽 마라톤 경주가 열리던 날 경주마처럼 질주하던 선수들의 역주와 잠실 주경기장의 폐회식 세레모니를 보며 웬일인지 암담해진 채 불안에 떨었다. 나는 새벽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과의 임의 동행 뒤 서울검찰청 특수2부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저녁 8시쯤 영장이 떨어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언제나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닥친다. 가정도 사업도 다 깨졌다. 주말마다 가족과의 외식으로 한일관 불고기를 사 먹고, 서울 연고구단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실야구장엘 가려던 꿈도, 휴일마다 목욕탕에 가서 어린 아들에게 등을 맡겨 밀려던 꿈도 찰나의 꿈인 듯 사라졌다. 아, 고요한 시절이 오기란 아예 글러버린 것인가? 나는 무슨 새를 쏘아서 떨어뜨렸던가? 새는 돌이 되어 저렇게 책상 위에서 흐느끼던가? 낙엽을 밟고 오는 계절이여, 가을 저녁 횃대에 올라가 길게 울던 수탉이여. 나는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하던 녹색당 당비를 더는 내지 않으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