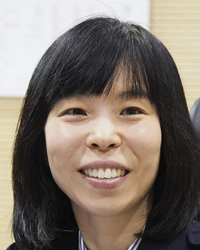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가 불쑥 웬 과자 이름을 언급하며 최근 새로운 맛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머, 네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난 그거 보자마자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한 건데. 오래전 레퍼토리를 새삼스럽게 들먹이며 친구는 한참이나 나를 놀렸다. 그래놓고는 괜히 미안했는지 한 번의 말실수로 자신을 수십 년째 즐겁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친구가 말하는 이십여 년 전의 사건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말실수야 평소에도 종종 있었고 그것의 여파와 그로 인해 내가 치른 대가를 따져보면 사실 그 일 정도는 대수로운 축에도 못 끼지만 친구들이 나를 두고두고 놀려먹기 좋은 사건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살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으나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것들 중 하나는,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이어지면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 같다는 걱정에 사로잡히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도 좋을 말과 해서 좋을 것 없는 말을 가릴 새도 없이 아무 말이나 주워섬기며 호들갑을 떤 다음 뒤늦게 혼자 그 상황을 복기하며 후회한다. 스무 살 무렵, 그때도 그랬다.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모의한 특정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있었다. 선배 언니의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대학에 들러 고학번 남자 선배 한 명을 태웠다. 나야 초면이지만 그와 언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어째서인지 둘 다 형식적인 안부만 건네고는 별 말이 없었다. 셋이 타고 있는 차 안에 계속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차가 휴게소에 들렀다.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온 남자 선배가 언니와 내게 캔 커피며 과자가 든 봉지를 건넸다. 순간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과자 때문이었다. 제조사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서 당시만 해도 시중에 판매처가 드물었던, 그래서 무척 좋아하면서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 과자가 마침 그 휴게소에 있었다니. 게다가 많고 많은 과자들 중 바로 그것을 신통하게도 그 남자 선배가 골라왔다는 것이 어찌 신통하지 않겠는가.
언니가 그 과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진심이기도 했거니와 차 안의 어색한 침묵도 깰 겸 해당 과자에 대한 나의 사랑의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소상히 이야기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는 이 과자 공장 사장 아들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 나는 두 선배님들이 어이없어하며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 기대했다.
뜻밖에도 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언니가 물었다. 너 알고 말한 거 아니지? 모르고 말한 거지? 네? 뭘요? 언니가 픽 웃었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 선배도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초면에 이런 식으로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이를 어쩌지, 하는 복잡한 눈빛으로.
알고 보니 그가 바로 고등학생 시절 내가 꿈꾸던 미래의 신랑감, 해당 과자 제조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언니도 웃고 남자도 웃었지만 나는 정말이지 너무 당혹스러워 프로젝트고 뭐고 당장 차에서 내리고 싶었다. 그래도 그 일로 이십 년 이상 친구들이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기억 하나를 만들어주었으니 흔히들 말하는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말실수 사건이었다고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