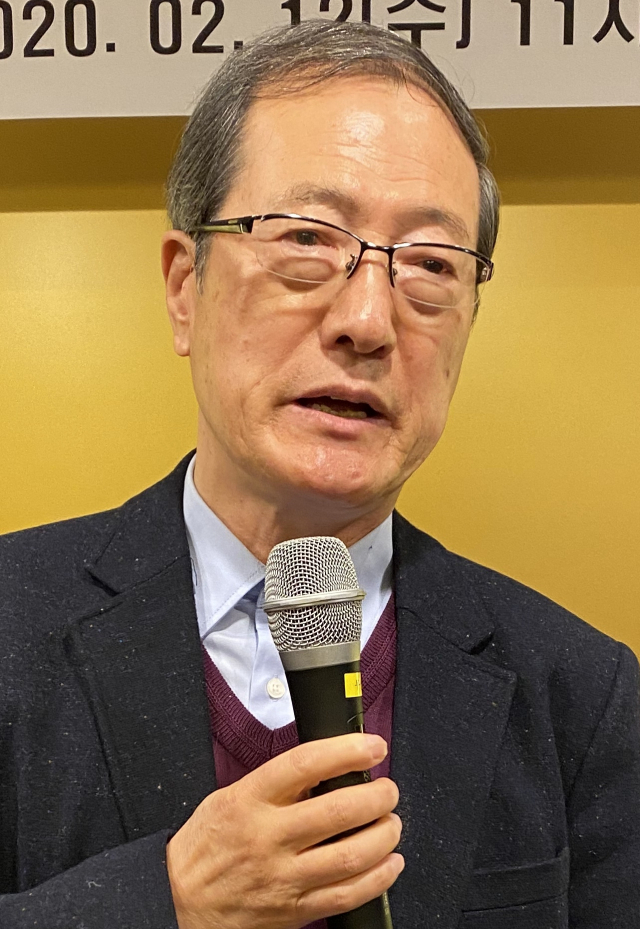
팔월 초순, 명주사를 찾아 나섰다. 스물일곱 젊은 날 한 번은 꼭 찾아가고 싶었던 명주사-그로부터 사십여 년이 지난 지금, 내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흔들렸다. 어성전 본말에서 동남방향 언덕 산문(山門)을 향했다. 구불구불 몇 굽이 숲속 길을 따라 오르다 마주친 일주문 ?그곳에 새겨진 ‘滿月山 明珠寺(만월산 명주사)’ 여섯 글자가 내 작은 육신을 내리눌렀다. 잠시 후 저만치 산비탈 아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명주사 극락전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내 의식 속에서 법당문이 스르르 열리며 부처께서 지긋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가 내게 물었다. ‘그대, 젊은 날의 순수는 다 어디에 두고 이제서야 세속에 절은 몸을 이끌고 나를 찾아 왔는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무 살, 내가 당신의 품속을 찾아 길을 떠나던 날의 아픈 기억을. 만월산 자락에 위치한 명주사는 비로(毘盧)나자불을 모신 천년 고찰로서, 고려 목종 12년(1009년)에 창건한 혜명(惠明)과 대주(大珠) 두분 스님의 이름 끝자를 따서 명주(明珠)사라 명명하였다. 부처를 모신 법당은 대웅전이 아니라 극락전이었다. 왜 극락전인가. 극락에 이르는 곳이란 뜻일까. 중생들이 꿈꾸는 그곳-극락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합장을 한 후 요사채 네 귀퉁이 벽면의 불화를 천천히 감상하다가 순간 나무기둥에 세로로 쓰인 문구에 강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삶을 천착(穿鑿)한 진리의 법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찰에서 보지 못한 경구들이 새겨진 나무기둥의 어휘들이 마치 모세의 십계명처럼 각인된 목판활자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죽비를 강하게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다. 아아, 중생들 삶의 무상을 이리도 명쾌하게 설파한 문장이 어디 또 있으랴.
나는 이 4행 시조에 그만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어두어 한 가지에 같이 자던 새/ 날 새면 서로 각각 날아가나니./ 보아라 인생도 이와 같거늘/ 무슨 일 눈물 흘려 옷을 적시나.” 참으로 인생의 사계절을 적절히 묘사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1행은 인생의 봄(유년기)을, 2행은 여름(청년 시절)을, 3행은 가을(중년)을, 그리고 4행은 겨울-그 생의 끝자락에서 지난날 온갖 영욕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회한에 잠겨 눈물 짓는 노년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다음의 시어들이었다. “얼마나 미워해야 사랑이 싹트고/ 얼마나 속아야 행복하고 얼마나 버려야 자유스러울까/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고/ 얼마나 썩어야 종자로 열리고/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얼마나 사무쳐야 하늘이 열릴까.”
그렇다. 세속에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속이거나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오만해지는 자신을 잊고 산다. 나 자신 그러하였거늘 누구를 탓하랴. 아아, 우리는 얼마나 미워해야 사랑이 싹트고,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글과 그림에 능한 지혜 스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그 아쉬움보다 더 커다란 위안을 얻었으니, 그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생의 미망(未忘)과 무명(無明)을 일깨워준 화두 하나를 건져 올린 것이었다. 산문을 내려오려는데 산신각 아래 좌정한 달마 스님이 배시시 웃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여름날, 한낮의 산사(山寺)는 푸른 적막(寂寞)의 바다 속에서 졸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