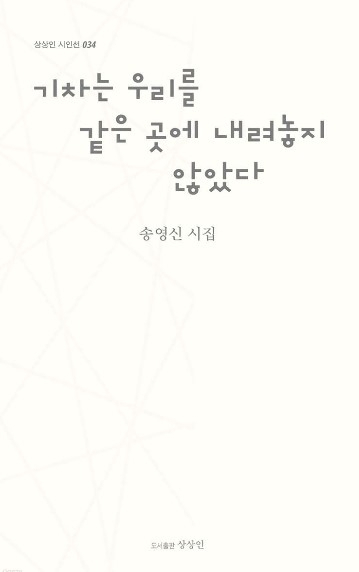
태백출신 송영신 시인이 시집 ‘기차는 우리를 같은 곳에 내려놓지 않았다’를 상재했다.
시집은 ‘너와 내가 한 방향일 때’ ‘그때, 미워졌으면 한다’ ‘누군가의 약속이 되었으니’ ‘우리가 나무이면서 나무가 우리이면서’ 등 4부로 구성, 60여편의 작품을 담고 있다. 응어리진 서사와 감정들이 날카로운 형태로 엮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어떤 시간을 살아야 끝내 풀어내지 못한 애달픔을 이리도 아프게 적을 수 있을까. 송 시인의 단어는 모두 단단하고 또 일상적이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나면 예리하게 벼린 칼날이 돼 가슴 한 가운데를 관통한다. 아니, 구겨진 종이에 베인 것마냥 쓰라리다. 언제쯤이면 타는 듯한 고통이 가실 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송 시인은 삶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이르러 ‘실타래 같은 인연’을 풀어내다가 ‘순응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를 들여다본다. 이처럼 작품의 제목이자 시어들을 하나로 조합하니, 결국 또 그가 생각하는 공허함으로 응고된다. 책의 모든 페이지를 넘기고서야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다. 각각의 주제로만 여겼던 시편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복잡한 설계도 속에 연결돼 있다.
그의 세계는 계속해서 부재(不在)를 가리키고, 그 속에 존재하는 허무한 몸짓을 응시한다. 나의 존재이유였던 ‘너’를 보내고 이를테면 남겨진 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 시인에게 시쓰기란 어떤 의미였을까. 온 신경을 집중한 끝에 그리움의 전언을 눈 앞에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으려나. 그는 ‘너’와의 추억을 환기시키며 끊임없이 망각을 거부하는 여정을 걷는다. 그것이야말로 침묵중인 ‘너’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안부이기 때문이다.
도서출판상상인 刊. 160쪽.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