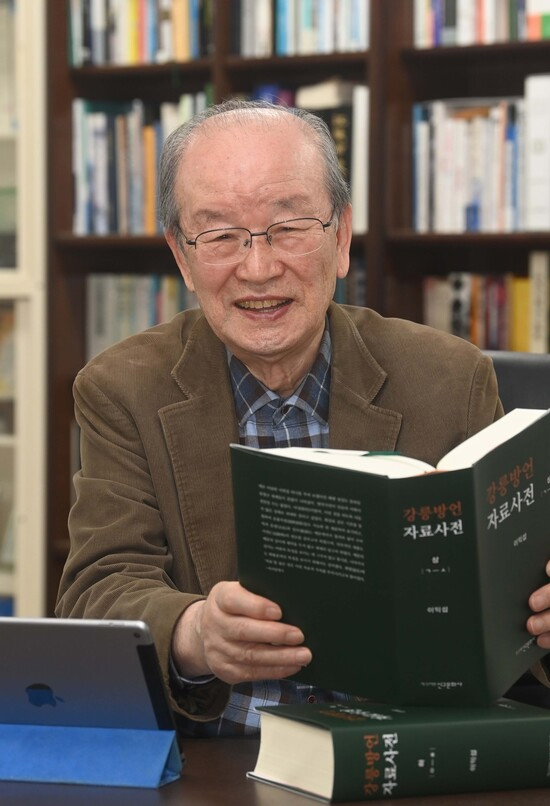
■서울대 퇴임 후 다시 방언 조사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유가 있는지=서울대를 퇴직하기 전부터 퇴직하면 카메라 하나 들고 꽃 찍으러 다닐 생각이었지. 고대희랍부터 우리나라 고전까지 책이나 읽으며 한가하게 보낼 생각이었다. 2011년부터 강릉방언 조사를 시작했다. 퇴직하고 10년 지나서다. 강릉사투리대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강릉의 한 교수가 강릉방언사전을 냈다고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형식적이라도 좋게 서평을 써줄 수 없었다. 자기가 조사한 것도 별로 없었고 전에 김인기씨가 펴낸 강릉방언사전을 그대로 인용해 표준국어사전의 해석대로 쓰다 보니 원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을 해 놓은 것도 여럿 있었다.
예를 들면 ‘버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버덩'을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우거진 거친 들'이라고 해석해 놨다. 그런데 강릉말에서 버덩은 ‘논' ‘옥토'다. 속담에도 ‘산옆서 살더가 버덩으로 시집왔으면 출세했지'라는 말도 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강릉에 이런말이 있었다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말이 많다. 그래서 나의 소명이 됐다. 어휘수 2만개가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 수집됐다. 길지 않은 기간 이만한 자료가 모여,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됐다는 것에 스스로 벅차다.
■처음 시작하실 때 10년 동안 이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처음에는 한 3년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새 10년이 넘었다. 머리말에도 썼지만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전해서 오는 것도 힘들고 방바닥에 앉아 몇 시간씩 얘기 듣고 나면 다리가 펴지지 않아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 3~4일 현장 조사를 해서 집에 돌아가면 녹음된 것을 노트에 받아적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이 꼬박 한 달이 걸린다. 그렇게 정리한 노트가 50권이 넘더라. 몰아놨다가 했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다. 매번 꾸준히 채록해 기록하고 어원을 찾으며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휘집 하나 꾸려 보겠다고 시작했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강릉말을 만나고 상상도 못 하던 엄청난 세계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신명 났다. 제자들에게 논문 쓸 때 ‘숙제하듯 하지 마라'는 말을 자주 했다. 즉, 남의 눈에 좋게 보이게만 하지 말고 스스로 좋아서 하라는 충고였는데 숙제하듯 안 했다. 즐거웠고 신명 났고 고생도 많았지만 고생이 고생으로 안 느껴졌다. 주문진읍 교항2리 삼총사 어르신, 연곡면 유등리 홍씨 어르신, 사천면 덕실리 최돈춘 어르신, 서지초가뜰 어르신 등 강릉의 지킴이가 되셨던 분은 모두 뵈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가운데 반 이상 돌아가셨다. 그것이 제일 아쉽다.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책을 냈다고 보고드리고 싶고 옛날 얘기하고 싶고 정이 많이 들었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크다.
■강릉말에 특징이 있다면=박사학위논문으로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서울대 출판부, 1981)'을 썼는데 강원도사투리도 영동과 영서가 확 갈린다. 강릉사투리를 가지고 강원도사투리라고 하는데 춘천, 원주말을 강원도사투리라고 안 한다. 또 강릉사투리도 강릉 중심으로 가까운 양양과 삼척이 또 다르다.
‘설 쇠면 추위가 구들로 게 든다'는 강릉속담이 있다. 설을 쇠고 나면 봄이 찾아오는데 봄 추위가 매섭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릉말이 얼마나 구김살 없고 순수하냐. 말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민속, 기후, 문화, 풍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강릉말로 새총, 고무총을 ‘느르배기'라고 하는데 말 만든 것이 이쁘고 감각있다.
‘정지밖'이라는 말도 있다. 부엌의 바깥 공간인데 강릉에만 있는 말이다. 강릉에서 ‘정지밖'에는 곳간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작은 마당이 있어 나물도 말리고 거기서 널뛰기도 하고 놀았다. 정지밖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면 이름이 따로 있겠는가?
‘모탱이'도 공간을 지칭하는데 굴뚝 모탱이, 사랑 모탱이, 우리 마을 모탱이처럼 공간을 확장해 간다. 느르배기, 정지밖, 모탱이 등은 강릉에만 있는 말인데 이쁘고 감감적일 뿐만 아니라 민속, 풍경, 기후, 문화 등 강릉사람들의 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강릉방언 자료사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표제어가 강릉말이다. 뜻풀이에는 표준어를 제시하고 민속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넣었으며, 발음과 성조에 관한 정보도 담았다. 또 중세 국어 등 옛말의 흔적이 보이는 사안은 별도로 정리하고, 현장감을 살린 예문을 실었다.
예컨대 ‘가개부'는 “가계부(家計簿). ‘가:개'(가계·家計)에 있던 장음이 없어지는 것이 주목된다”로 풀이하고, 예문으로 “먼:재는 우리 둘:째거´가니, 가개부르 쓰더래∼”라는 예문을 실었다. 강릉말을 표제어로 싣고 강릉말 발음 그대로 썼으며 높낮이와 말의 길이까지 모두 표기했다. 낯선 방식이지만 강릉 사람들은 읽다 보면 말이 된다. 가장 다른 점은 예문을 많이 썼다. 표준국어사전에도 없는 예문이 정말 많다. 예전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사전을 펴냈을 때 말에 대한 설명만 있고 예문이 없는 것이 많았다.
또 ‘조율'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폐백'이란 해석이 붙어 있다. 예문도 없이 폐백이라고 해 버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장반'이라는 강릉말을 조사하다가 왜 폐백인지 알게 됐다. 폐백할 때 장반을 올린다는 말을 하는데 시할머니께 엿장반 올리고 사당에는 거치장반, 시어머니께 조율장반을 올린다고 하더라. 장반은 쟁반을 일는말인데 시어머니께 대추와 밤을 담은 조율쟁반을 폐백에 올렸다는 말에서 조율=폐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예문이 같이 수록돼야 정확한 뜻과 말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문화분권에 사투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강원일보에서 강릉사투리대회를 오랫동안 주관해 왔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드물고 그 사투리대회에 대한 강릉사람들의 사랑도 남다르다. 강릉에 사투리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강릉의 농기구, 사라져 가는 옛 물건을 모아 강릉말로 적어놓고 강릉사투리대회 상 받은 사람들 영상도 틀어놓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들을 녹음해놓고 녹화해 두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강릉 가는 차를 타는 터미널에만 가도 말을 들으며 강릉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요즘은 강릉에 와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 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투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과거에 세계 언어학자들은 미개한 나라의 말은 언어도 미개할 것이라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 민족이 미개하다고 문명, 말도 미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영어로 다루지 못하는 것을 미개국의 나라에서는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색이다. 즉, 새로운 말을 만나는 것은 갇혀 있던 사고에 새로운 지평을 만나는 것이다. 사투리도 표준어로 보면 과거에는 촌스럽고 무언가 모자라는 듯한 취급을 받았지만 사투리를 쓰면 표준어에 갇혀있던 사고의 지평이 넓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이다. 강릉 사투리의 개성은 정말 남다르다. 도시의 개성이 없으면 천편일률로 똑같아지는 것이다. 말이 살면 그 지역의 개성이 산다. 지역문화가 살고 사람이 살고 강릉이 꽃피는 것이다.
조상원 강릉주재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