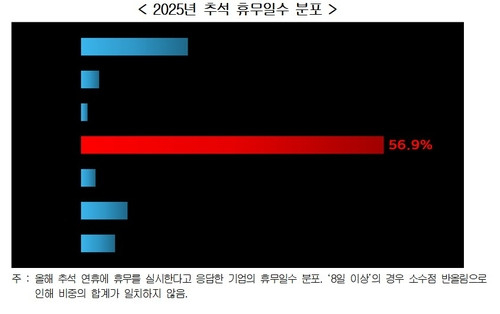피부감각 일종인 압각
통각·온각 복합된 감각
일본말로 '맛 나는(Good taste)'이란 뜻을 가진 우아미(Umami)를 다섯 번째 맛으로 친다. 치즈나 간장 같은 발효식품이나 우린 국물, '다시마' 등의 핵산조미료에서 나는 맛이다. 토마토나 곡식, 콩에서 나는 향긋하거나 고기냄새 같은 것도 같은 맛으로 이는 식욕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알다시피 떫은맛(Tannin)과 매운맛(Hot taste)은 맛(미각)이 아니다. 떫은맛은 오로지 피부감각의 일종인 누름감각(압각)에 속하고, 매운맛도 다만 통각과 온각이 복합된 피부감각에 속한다.
어쨌거나 썩은 음식, 독이 든 먹을거리를 꼬치꼬치 가리지 못하고 막 먹어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 하겠다.
혀에서 역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릇 여러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부어 설탕을 조금씩 늘려 녹이고, 차례대로 단맛을 본다. 아주 적게 넣은 것에서는 덤덤하게 감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농도에선가부터 가까스로 단맛을 느낀다. 즉,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문턱·Threshold)라 한다. 그리고 단것을 먹은 다음에는 단맛(짙기)을 더 높여야 그 맛을 느끼는 것은 역치가가 올라간(높아진) 탓이다.
도시 사람들은 소음에 대한 역치가가 높고, 즉석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단맛과 짠맛에 대한 역치가 높으며, 재미나는 이야기도 자꾸 듣다 보면 기대심리가 높아져 여간 재미난 것이 아니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행복의 역치가도 다락같이 올라가 여간해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됐으니 탈이라면 탈이다.
혀는 오관 중에서 유독이 고집불통이다. 늙어서도 어릴 적에 먹던 먹을거리를 먹고 싶어 안달하고, 외국에 살면서도 마냥 고향음식을 그린다. 며칠 다녀오는 여행 가방에 김치, 고추장은 뭐며, 또 김, 라면은 웬 말인가.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것이든 고루고루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