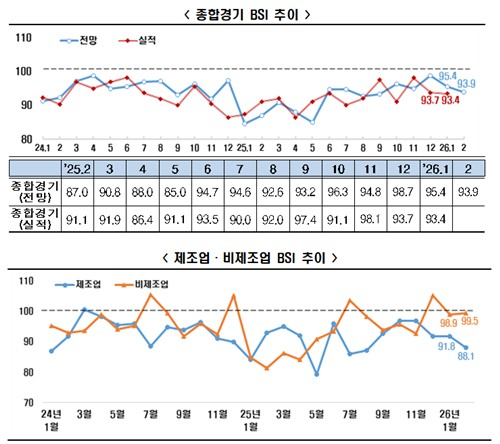어린 시절 대관령 산골에 살았는데 마을 가운데에 6번 국도가 있어 늘 버스를 보고 살았다. 완행버스는 구멍가게 앞에서 손님을 내려놓거나 태우곤 했는데 직행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냥 지나갔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완행버스를 타기 시작한 건 20리 밖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면서부터였다. 아침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그 버스를 놓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다. 버스는 김밥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늘 만원이었다. 껄렁껄렁한 고등학교 형들은 맨 뒷자리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다.
직행버스로 옮겨탄 건 고등학교로 가면서부터다. 진부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성의 새말까지 가는 길은 괜찮았는데 다음이 문제였다. 새말, 횡성, 홍천, 춘천 가는 길은 옛날 대관령의 비포장도로보다 더 지루했다. 자그마한 고갯길의 연속이었다. 쉬는 시간까지 합쳐 4시간은 걸렸는데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더 먼 데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었다. 탄광촌 태백에서 원주까지는 기차로, 원주에서 춘천까지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그 얘길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유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에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 버스는 만원이었다. 터미널에 늦게 도착하면 버스 통로에 앉거나 서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횡성까지는 가야 자리가 났다. 멀미를 졸업한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여학생 옆에서 멀미까지 할 수는 없잖는가.
대학생이 되자 버스는 마침내 여행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아직 강원도는 기차보다는 버스가 대세였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직행버스, 완행버스, 시내버스를 갈아타면서 찾아다녔다. 한탄강 고석정으로 가는 철원평야, 휴전선을 넘어온 막막한 눈보라를 잊을 수 없다. 늦가을 한계령에서 허공으로 솟구치는 단풍을 나중에 시인이 될 후배와 함께 시청했다. 마음에 두고 있는 후배와 7번 국도를 달려 삼척 장호항의 파도 앞에 도착했을 땐 사랑의 어떤 막막함에 빠져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안주도 없이 소주만 비웠다. 소나기 퍼붓는 삼척 하장에선 달리던 버스가 고장 나 중도에서 내려 텐트를 뒤집어쓰고 태백을 향해 걸었던 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태백에서 다음날 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는 내 인생의 가장 지루한 버스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버스가 충청북도 제천을 통과한다는 게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다. 춘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버스가 언젠가부터 하나둘 직통으로 바뀌자 대관령으로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원주에서 갈아타야만 했는데 그게 분해서 한동안 씩씩거렸다. 아, 검문소란 게 있었다. 장발을 휘날리고 다니던 시절 나는 버스가 검문소에 멈춰 설 때마다 검문을 당했다. 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란 소설을 써서 상까지 받았으니 그리 억울하지는 않았다.
얼마 전 가본 고향의 터미널은 한산하다 못해 스산했다.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중학생이었을 때 나는 가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 와 서울 얘기를 풀어놓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거짓말이었지만. 다시 까까머리 시절로 돌아가 버스를 타고 아주 멋진 가출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