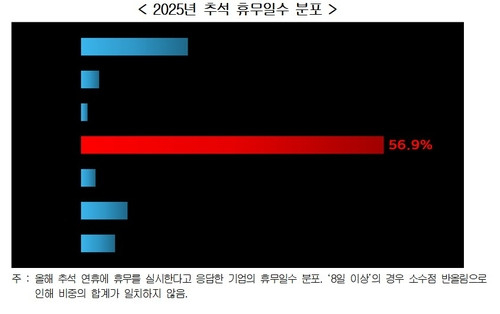“나·랏 :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579돌 한글날(10월9일)을 맞아, 세종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을 다시 떠올려본다. ‘훈민정음’, 곧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창제의 목적이자 철학이다. 문자의 발명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바른 소리를 나누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선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언어 현실은 어떤가. 세종대왕이 열어준 소통의 광장은 혐오와 조롱의 목소리로 메워지고 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아니라,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되곤 한다. 욕설은 일상어처럼 쓰이고, 익명 뒤에 숨은 비난은 유행처럼 번진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정치 현장과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고대 사상가 양웅은 '법언(法言)'에서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라고 했다. 말은 곧 마음이다. ▼거친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따뜻한 이해의 싹이 자라기 어렵다. 언어가 흩어질수록 공동체의 신뢰 또한 무너진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넘쳐나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내전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국 오대십국 시대 정치가 풍도(馮道)가 '설시(舌詩)'를 지으며 '설참신도(舌斬身刀·혀는 몸을 베는 칼)'를 넣은 이유다. 따뜻한 한마디는 무너진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품격 있는 문장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인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결국 말에 있다. ▼훈민정음의 정신은 문자의 과학적 우수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본질은 사람을 향한 언어, 공동체를 세우는 소통,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는 말의 윤리에 있다. 말의 칼끝으로 서로를 겨누는 대신, 말의 넓은 품으로 서로를 안을 때 비로소 훈민정음의 정신은 살아날 것이다. 한글, 우리는 언제나 이 위대한 유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언어로 서로를 마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