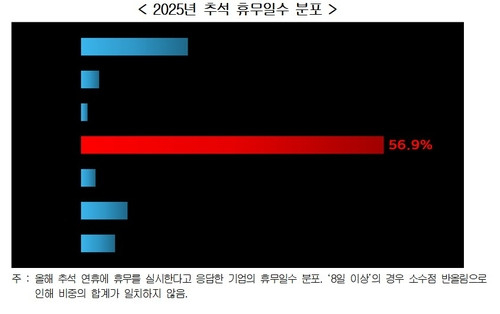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는 총 74개의 어촌마을이 있다. 예부터 강원 동해안은 어선어업 중심으로 오징어, 도루묵, 문어, 대게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어업인 수도 2010년 8,320명에서 2024년 2,995명으로 64%나 감소했다. 또 강원연구원에 의하면 강원 어촌의 91%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해안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은 분명히 강원 어촌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깊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요트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 어촌이기 때문이다. 어촌마을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촌마을에 대한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어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파란 하늘과 깨끗한 바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형적인 어촌의 풍경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한 어촌 중에는 폐어구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곳도 있다. 폐어구, 쓰레기 정리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의 특화지구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관광자원과 결합한 공동체 비즈니스의 활성화다. 강릉은 커피가 유명하고, 양양은 서핑이 유명하다. 그외 다른 지역의 관광명소는 대부분은 어촌에 위치해 있다. 즉, 이미 어촌에서는 멋진 바다풍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관광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혜택이 어촌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외지인의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어촌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어촌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촌은 농촌과는 다르게 어촌계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어촌계의 역할을 수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확대한다면 공동체 비즈니스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강원 어촌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은 예부터 내려온 고유한 어촌문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식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러한 고유한 전통문화를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 특히 남해안, 서해안과는 차별적인 고유한 어구어법을 활용한 어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최근 강릉 ‘창경바리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좀 더 많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 어업·어촌 관련 다양한 풍속문화, 먹거리 개발을 통하여 강원 어촌만의 차별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잡는 어업’보다는 양식업 중심의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동해안의 깊은 수심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 등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 어촌은 분명 타지역과는 다른 매력이 있고, 경쟁우위 요인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어촌을 만들어 어촌주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