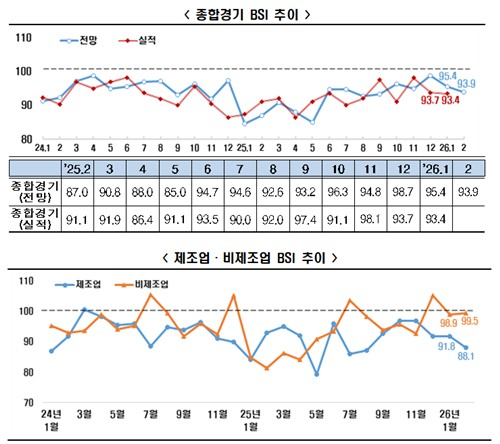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지만 이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20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촉구했다. 고성·양구·화천·인제 등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과거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과 형식적인 지정 기준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상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과 방식이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군 소음이 물리적으로 한정된 구역에서만 발생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실제 소음 피해의 범위와 강도는 지형과 날씨, 훈련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진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는 행정구역 단위가 광범위하고 생활공간이 집약된 마을 중심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 지정과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반영이 절실하다. 두 번째로 보상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현행 보상 체계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이미 15년 가까이 지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기준일 뿐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턱없이 낮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하락을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형식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또한 군 소음 대책지역의 지정 기간 단축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5년 주기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재지정하고 있다. 이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 군부대의 훈련 패턴이나 전략 변화에 따라 소음 강도와 범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만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단순한 소음 피해를 넘어 군사적 기능에 기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국가적 부담을 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인구 유출 등의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감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구체적 피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