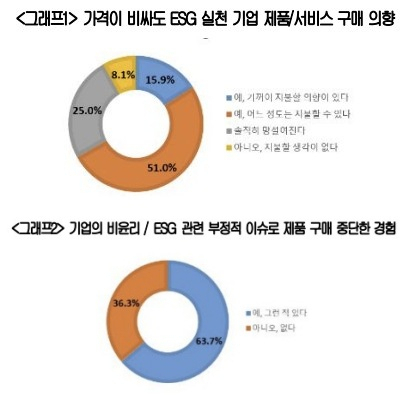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발효됐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이뤄진 13번째 사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포함해 총 17회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경비계엄은 6·25 전쟁(2회), 4·19 혁명(1회), 5·16 군사쿠데타(1회) 당시 4차례 시행됐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10월 25일 '비상계엄'으로 선포돼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됐다. 같은 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1948년 11월 17일(~12월 31일)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인 ‘합위지경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흔든 역사적 순간마다 등장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선포됐고,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1952년 5월25일 부산 정치 파동,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4년 6·3 항쟁, 1972년 10월17일 10월 유신 등 대한민국 정치사의 갈림길마다 반복됐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는게 전통적인 해석이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계엄령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같은 배경 속에 '12.3 비상계엄령'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