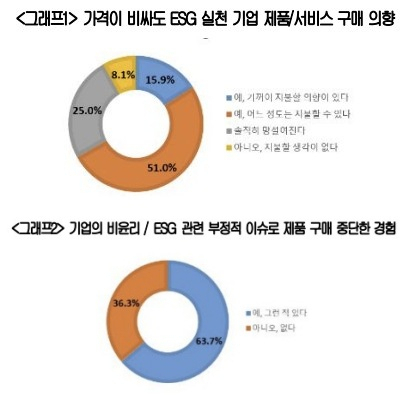조선 건국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근거없이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입 한번 잘못 놀린 죄로 실제 목숨까지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으니,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서 요언(妖言·인심을 혼란하게 만드는 요사스러운 말)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물었던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도 각양각색이었다. 가짜뉴스는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론’과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그것이다.
악학궤범, 용재총화로 널리 알려진 홍문관 부제학 성현(1439~1504)은 1478년 성종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왕에게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사실상 호통에 가까웠다. 성현은 상소에서 “좌도(左道·옳지 못한 도)로써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 없이 처벌(處罰)하고, 요언(妖言)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용서없이 죽인다고 했다”고 강조한다. 성현이 이같이 말한 것은 당시 성(城) 안에서 조차 액을 물리치고, 병을 구제한다는 말을 듣고 무당을 불러 저속한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에 대해 죄도 묻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선왕들이 이륜(彝倫·떳떳한 의리와 윤리)에 맞게 천하를 다스린 가르침을 성종은 왜 따르지 않느냐는 일갈이었다.(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30일)
1634년 장령 강학년(1585~1647)이라는 사람은 인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전하의 국사(國事)는 이미 위태롭고 어지러운 지경에 들어갔다. 여러 차례 큰 난을 겪었는데도 조금도 허물을 반성하지 않고 고식책(姑息策)만을 써서 저절로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가했다.(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1월 3일) 광해군을 폐위 시킨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와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소는 거짓 글로 왕의 정통성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이에 사헌부와 사간원이 연이어 강학년의 삭탈 관직을 왕에게 요청하지만 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그를 천거한 이조판서 최명길을 시작으로 신하들이 연이어 자신을 파직해 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인조는 파직을 명한다.(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2월 9일)
이러한 명을 내리기 며칠전 인조는 재차 강학년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조는 “그의 소장 중에 있는 이른바 ‘중지(中智)’라는 말은 직언(直言)이며 어질기를 권면한 뜻 또한 충성스러운 것이니, 그의 어리석은 점을 용서해 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12월 4일) 결국 강학년을 유배 보내게 된 인조는 크게 분노한다. 대사간 이준은 강학년의 처분을 두고 신하들이 대립한 것에 대해 노여움을 풀고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한다.(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