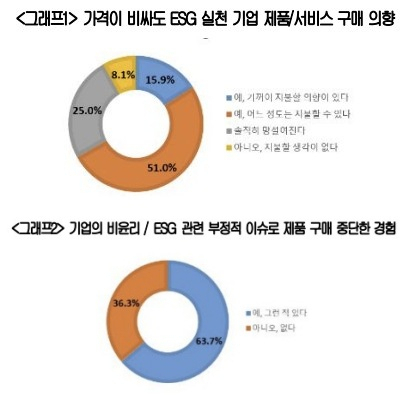똬리를 생각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참으로 그립다. 어머니는 부엌 벽에다 늘 똬리 2개를 걸어 두고 썼다.
동이로 집 앞 개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 공동 우물로 물을 길어 가실 때나 일꾼들이 밭매기나 모내기할 때 먹거리를 이고 가실 때는 아버지께서 왕골로 정성스레 만든 똬리를 머리에 꼭 얹고 가셨다. 부엌에는 늘 왕골 똬리들이 반들반들 윤이 나 부뚜막에 앉거나 벽에 걸려 있었다.
똬리는 통통하게 배가 부른 둥근형으로 어머니 머리 넓이와 비슷했다. 이것이 머리를 안전하게 덮기 때문에 양손에 주전자나 다른 물건을 들고 가셔도 안심이 됐다.
옛날에는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기보다는 머리에 이고 다녔다. 먼 길 장 보러 갈 때도 똬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물건을 등에 지고 나를 수 있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챙겼다. 여자들은 똬리를 머리에 올려 짐을 이고 날랐다. 무거운 짐이야 소달구지나 손수레를 써먹었다. 똬리를 얹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게 받침이 노릇을 톡톡히 했다. 어느 집이고 몇 개씩은 준비가 된 가재도구였다. 없을 때는 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받치기도 했다. 똬리는 대개 짚이나 왕골을 말아 만든다. 때로는 헝겊이나 죽순 껍질을 쓰기도 했다. 크기는 쓰는 사람의 머리둘레만큼이다. 모양은 동그랗게 아이들이 즐기는 도넛 모형이다. 앞쪽에는 똬리를 머리에 올렸을 때 입으로 물 수 있게 길게 끈을 만들어 붙였다. 이 끄나풀을 입에 물고서 똬리를 머리에 올리면, 짐을 올리고 내릴 때 똬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똬리는 또아리라고도 부른다. 또아리는 똥아리였을 것이다. 똬리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에서 사용했다. 전라도에서는 또가리라고했다. 경상도에서는 따뱅이라고도 불렀다. 지방에 따라 또아리라고 하거나 또가리나 뙈가리라고 불렀다.
요즘엔 똬리를 보기 힘들다. 간혹 할머니들께서 머리에 올려서 가는 것을 본다. 똬리만 얹으면 중심을 잘 잡는다. 물동이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전혀 불안하지 않다. 물동이를 일 때 몸의 중심이 맞지 않아 출렁거림을 막는 비결이 있다. 물동이 안에다 호박 바가지나 호박잎을 띄운다. 그러면 촐랑대기만 하지 밖으로 물이 넘치지는 않는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운반수단이 발달해 똬리는 아무 데서나 보기조차 힘들다. 그만큼 운반수단이 많아지고 발달했다는 증거다.
고향 갔을 때 똬리 위에다 가득 담긴 물동이를 한 번 여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