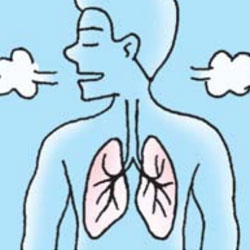
횡격막·늑각근의 상하운동
폐 자극해 들숨·날숨 도와
날숨(호기·呼氣·Exhalation)은 폐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는 것인데,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연수(숨골)가 자극을 받아 횡격막이 복강(腹腔)으로 올라오고, 늑골(갈비뼈)이 눌려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허파꽈리(폐포·肺胞) 내 공기(이산화탄소)가 기도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폐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수축, 이완하지 못하므로 자율신경의 조절로 횡격막과 늑간근의 상하운동에 따라 숨을 쉰다.
한편 들숨(흡기·吸氣&·Inhalation)은 공기가 폐로 드는 것으로, 외늑간근(外間筋)이 늑골을 위로 들어 올리고, 횡격막이 복강을 눌러 내리면 흉강이 넓어져 흉강 내 압력이 낮아지고 기도(氣道)를 통해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된다.
호흡지간(呼吸之間)이란 숨 한 번 내쉬고 들이 쉬는 사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들숨 끝에 날숨을 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 삶과 죽음이 바로 호흡지간에 매였고, 문턱 넘으면 저승이다.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을 뜻하는 호흡지간과 비슷한 말에 ‘순식간'과 ‘별안간'이란 말이 있다. 경각(頃刻)이나 촌각(寸刻)보다 더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한순간(瞬間)이란 말을 쓴다. 순(瞬)은 눈을 깜빡거림을 말하니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뜨는 짧은 시간을 뜻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별안간(瞥眼間)의 별(瞥)은 문득 스쳐 지나듯 보는 것으로 별안간이란 눈 한 번 돌릴 사이의 짧은 시간을 가리키며 ‘갑자기', ‘난데없이'란 뜻으로도 쓴다.
계륵(鷄肋)은 말 그대로 닭의 갈비(Rib)가 아닌가? “닭의 갈비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은 형식만 있을 뿐 보잘것없음을 뜻한다. 또 버리기에는 아깝고 뜯어 먹을 살은 없으니 큰 소용은 못되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빗대는 말인데, 몸이 작고 삐쩍 마른 것에 빗대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