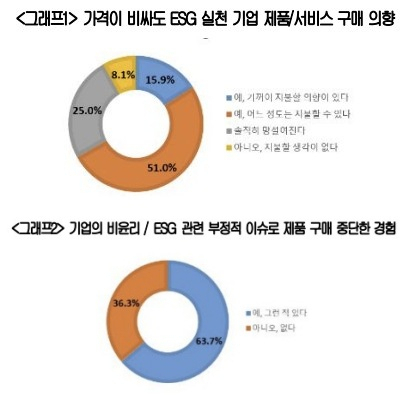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24시간의 평등함에 예외는 없다. 주어진 시간 자원 앞에 부자도 빈자도 공평하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의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매우 다른 문제다. 우리는 강원도라는 공간 속에서 24시의 시간 안에서 자신만의 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계속되어 시대를 만들어 가고,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대관과 역사관이 중요한 만큼 분명한 시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역사는 지난 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이다. 독일어는 역사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다. 히스토리에 (Historie)와 게쉬히테(Geschichte)다. 사건의 기록을 중시하는 히스토리에와 사건의 뜻풀이를 중시하는 게쉬히테로 구분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히스토리에이지만 남이 보고 해석되는 삶은 게쉬히테다. 히스토리에를 살아가고 게쉬히테를 남기는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강원의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게쉬히테를 남겨야 하는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적 화두와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이라고 하기에는 경제·정치·지리적 위치가 애매하고, 적은 인구와 미미한 GRDP(지역내총생산), 큰 면적에 다중고의 규제에 쌓여 있는 열악한 지역이다. 무엇이 강원의 길이며 게쉬히테인가? 우리 스스로가 직접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차별적인 혁신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강원도의 자치적 삶의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 강원의 역사(게쉬히테)를 선물할 것이다. 길을 가려면 좋은 도로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와 체계와 구조가 필요하다.
2000년 전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천천히 서둘러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천천히 하다 보면 제 시간에 끝내기가 어렵고,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될 터라 모순적으로 들리는 표현이다. 그리스인들의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중적 사고를 갖고 있다. 크로노스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24시간의 자원은 바로 크로노스다. 카이로스는 기회를 의미하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 서두르다를 카이로스로 이해하고 천천히 또한 카이로스의 손에 들려 있다는 저울처럼 신중하고 여유 있다는 의미의 카이로스적으로 이해한다면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은 깊은 공감을 주는 표현이다. 카이로스가 게쉬히테를 만드는 것이다. 강원의 시간과 시계 안에 얼마나 카이로스와 게쉬히테가 들어가 있는가가 바로 강원의 길이다. 필자는 강원도의 도민이 되어 춘천에 산 지 32년이 지났다. 서울의 24년과 해외의 10년의 삶을 더한 것이 나의 카이로스적 히스토리에다. 강원도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평화롭고 평안한 것도 사실이다. 평안함 속에서 어떠한 나와 우리의 게쉬히테를 남겼는가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게쉬히테적 시계는 멈춰 있는 듯하다. 멈춘 시계를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점점 뒤처지는 듯한 강원도의 시계를 일단은 서둘러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 또한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고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천천히 신중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천천히와 서둘러라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강원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차야 할 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