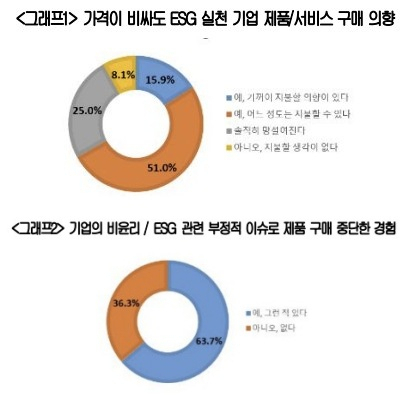지역 신문을 읽다 보면 중앙지와 비교하여 눈길을 끄는 기사가 종종 있다. 지역 출신 인사들이 정계나 관계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거나 승진한 내용을 전하는 뉴스들이다.
특히 정부 중앙부처의 주요 보직에 지역 출신 인사가 진출하면 관련 소식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모름지기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니만큼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출향인사'라는 말로 더 익숙한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게 미래의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적지 않은 기금들을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의 향토장학회가 대표적이다. '서울 진학'이라는 '쾌거'를 이룬 지역인재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재산목록 1호인 소까지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냈던 우리들 부모의 역할을 지금은 지역공동체가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의 부모 세대가 소 팔고 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것은 자식만은 자신처럼 시골 무지렁이로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식들은 또 그들대로 열심히 공부해 출세함으로써 부모의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했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이 효도의 완성이라는 옛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입신양명한 후의 풍경은 어떨까? 내심으로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함께 살았으면 하면서도 혹여 자식이 그런 속내라도 꺼내면 “여기 뭐 먹고살 게 있다고 내려오냐”며 부모는 손사래를 쳤고, 자식 또한 마지못한 듯 물러서면서 대신 두둑한 용돈 세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를 사면받곤 했다. 시대도 상황도 변했지만, 고향을 떠나 '대처(大處)'에서 성공한 출향인사들의 퇴직 후 풍경만은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입신해 중앙에서 벼슬 생활을 하더라도 직에서 물러나면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를 기르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조선시대 재지사족(在地士族·향촌에 삶의 근거를 둔 양반지식인층)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재지사족들은 낙향하지 않는다. 대신 경화사족(京華士族·한양과 그 근교에 거주하는 양반지식인층)으로 안주하며 이따금 고향 일에 팔을 걷어붙인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아예 귀향해 그 귀한 경험들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인재들을 완전한 '경화사족'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마다 십시일반으로 향토장학금을 모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귀향해 타지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고향을 위해 써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점은 지역에서도 반성할 부분이다. 그런 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출향인사들이 돌아와 봉사할 기회들을 만들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선산(先山)을 지킨 것은 우리라는 자부심은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둘 때 오히려 더 빛이 나는 법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추진할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궤도에 오른다.
큰일 경험이 많아 일머리를 아는 출향인사들과 지역 사정에 밝은 토박이 인사들이 힘을 합치는 문화가 일반화된다면 그 역량은 분명 배가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일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의 변함없는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