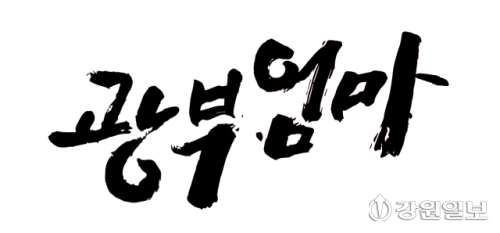
20년 경력의 선탄부 김매화(86‧삼척시 도계읍)할머니는 1976년 광업소 첫 월급부터 마지막 월급까지 명세서를 빠짐없이 모아두고 있다.
1만2,000원이 적힌 첫 월급이 70만원으로 늘어날 때 까지…두 아들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밑천이었다.
남편은 11살, 5살 아들을 남기고 광산사고로 숨졌다. 남편을 삼켜버린 광업소는 쳐다보기조차 두려웠다. 사고 후 2년 간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남편을 잃은 광부의 아내는 다시 탄광을 찾았다. 사고로 가장을 잃은 광부 가족의 비참한 삶을 잘 알고 있는 광업소는 선뜻 그에게 ‘선탄부’라는 직업을 마련해줬다. 김씨는 그렇게 광부의 아내에서 ‘광부엄마’가 됐다. 20년간의 선탄부 생활로 김씨는 오른쪽 폐를 도려냈다. 하지만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 생계 지원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숙연해져 어쩔 줄 몰라하는 강원일보 취재진 앞에서 김씨는 “고달프지만 원망은 없다”며 오히려 미소를 보였다.

■광산에서 숨진 남편, 남겨진 가족=삼척 도계광업소의 광부였던 김매화 씨의 남편은 1974년 막장에서 사고를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김씨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220만원. 장례를 치른 뒤 김 씨의 손에 남은 건 단돈 40만원이었다. 11살, 5살 난 두 아들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35살의 젊은 엄마. 하루 아침에 가장이 돼버린 김 씨는 먹고 살 걱정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었다.
김 씨는 “애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그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감과 옥수수를 내다 팔았다”며 “아이들에게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니까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탄광으로 향한 젊은 엄마=남편이 떠나고 2년 뒤 김 씨는 결국 남편이 숨졌던 도계광업소로 향했다. 당시 광산사고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은 선탄부로 우선 채용됐다. 남편의 사고 이후 2년 간 광업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김 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남편을 집어삼킨 칠흑의 탄광에서 김 씨는 매일 3교대로 석탄더미 속 정탄과 돌, 불순물을 골라냈다. 두 달여 간의 수습 생활을 거쳐 정식 선탄부가 된 김 씨의 월급은 당시 1만2,000원이었다.
김씨는 “선탄장에 들어면 먼지랑 탄가루가 사방에 날려서 앞이 안 보였는데, 그때는 마스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일을 했다”며 “얼굴이 온통 탄가루로 뒤덮혔지만 먹여 살릴 자식이 둘이라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기침이 나면 나는 대로 버텼다”고 했다.
■광부엄마는 비명조차 사치=선탄장은 사방이 위험이었다. 어느 날은 탄을 가득 실은 수레에 발을 밟혀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부어올랐고, 또 어느 날은 석탄을 실은 호퍼(깔때기 모양의 저장용기)에 부딪혀 팔이 굽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밥줄이 끊길까봐 병원은 커녕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김 씨에게 쉼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탄가루가 날리는 선탄장 한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진 도시락을 먹고, 일이 끝나면 목욕탕서 부리나케 탄가루를 씻어내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멍들고 까지는 건 부지기수고 수레에 깔린 발이 찢겨서 피가 철철 쏟아지는 날도 있었다”고 했다. 집에 가서 누우면 앓는 소리가 절로 났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못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광업소 트럭에 몸을 싣고 선탄장으로 향하다 보니 수십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광부엄마의 눈물=김 씨는 선탄부로 근무한 20년간의 월급 명세서를 꼬박 모았다. 빛바랜 명세서가 쌓일수록 아이들은 커갔고, 김 씨의 허리는 굽었다. 젊음과 맞바꿔 키운 자식들이지만, 정작 김 씨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어린 두 아들에게 3교대 근무로 바쁜 엄마의 빈자리는 컸다. 생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던 아이들을 회상하던 김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 씨는 “갑을병 3교대 근무조가 있었는데 을 근무가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다 됐다”며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아이들이 탄불을 피우고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아직도 그 모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쉼 없이 고단했던 삶=겨울이면 작업복이 그대로 얼어붙고, 여름이면 작업화 안이 온통으로 땀으로 가득차던 세월. 김매화 씨는 광산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로 허리를 펼 틈이 없었다. 쉬는 날에도 빈자리가 있으면 대타를 자처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동료들이 막걸리 한잔을 걸치러 갈 때도 김 씨는 집으로 향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집에는 빨래와 설거지가 산더미였다.
그는 “대타 자리가 났다 하면 제일 먼저 손 들어 한 달에 이틀쯤 놀면 많이 쉰 거였다”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이들 먹일 밥을 해 놓고 나갔다 돌아오면 곧장 개울가에 빨래하러 가야했다”며 웃음을 보이던 김씨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다.

■오른쪽 폐를 앗아간 탄가루=김 씨의 방 한편 빼곡히 놓인 약봉지들. 컨베이어 벨트처럼 쉴 틈 없던 20년의 세월 동안 김 씨의 폐에는 탄가루가 쌓여갔고, 20년 전 오른쪽 폐를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진폐장해등급을 받지 못하고 ‘의증’ 환자로 분류돼 김 씨는 단 한푼의 장해연금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기침이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는데, 날이 춥고 건조한 겨울엔 유독 기침이 심해져서 겨울이 오는 게 무섭다”며 “탄가루를 없애준다는 약을 매일 먹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워진 탄광의 여성, 선탄부=갱도 안 광부들이 산업전사로 추대 될 동안 선탄부들의 존재감은 지워졌다. 가장이자 주부로 살아온 세월, 김 씨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동료였던 선탄부를 기억해 달라고 했다.
김 씨는 강원일보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라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탄광촌의 애환이 고여있는 듯한 김 씨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취재진도 말을 잇기 어려웠다.
김매화 할머니가 먼저 입을 뗐다. “고단하긴 했어도 그 덕에 두 아들 다 키워냈으니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지는 않아…(진폐에 대한)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다가면 더 바랄게 없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