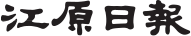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을 것이다. 고향은 늘 그리운 존재이자 부모와 친지가 기다리는 따뜻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고향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스민다. 마을 어귀마다 닫힌 집이 늘어나고,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정겨움은 여전하지만, 미래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신생아 수는 약 6,500명. 이 가운데 한 해 출생아가 100명도 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5곳에 이른다. 학구 광역화나 강원 유학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한 학년 평균 1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192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그마저도 몇 년 뒤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작은 학교가 정겨운 배움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구 구조의 압력은 거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친구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고,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또래 관계가 고정되고 경험의 폭이 좁아지기 쉽다. 학교마다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 내외의 환경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체험의 기회를 넓혀주기에는 한계가 크다. 국가 정책인 고교학점제 역시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과목 개설이 제한적이다. 과학 전공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학교도 생기면서 학생들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작은 학교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학년 시기의 장거리 통학은 피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집 가까운 곳에서 다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학년이 된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나며 성장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학교 존속’을 넘어, ‘내 고장 아이들이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지역의 교육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시점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는 지역 거점에 유·초·중·고 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캠퍼스 형태로 모아 규모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최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돌봄과 방과후 문화·체육 활동, 학습 지원을 맡는다. 돌봄, 도서관, 체육관, 진로센터를 연계해 ‘학교-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교사에게 가족 관사를 지원한다면 원거리 통근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는 곧 지역사회의 미래다.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교육 당국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거두려면, 내 고장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작은 학교를 넘어 지역의 교육력을 지켜내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실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