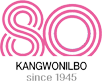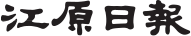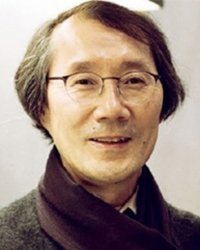
강릉은 효의 고장이다. 현재 강릉 일대에는 효자각, 효부각이 28곳에 세워져 있다. 내가 사는 회산동 집에서 학교 가는 길목에 서 있는 효자각은 한 주에 서너 번은 마주친다. 거기서 멀지 않은 금산에는 孝悌로 널리 알려진 臨鏡堂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이름은 일생 동안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고 효친과 우애로 수신제가한 김열(金說· 1506~?)의 호에서 연유한다.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을 儒家에서는 五常이라고 한다. 仁義禮智信이 그것이다. 공자가 仁, 義, 禮를 논하고, 여기에 맹자가 智를 더하고, 후일 後漢 사람 동중서가 信을 추가한 것이 오상이다. 그런데 임경당에는 仁義禮智와 信 사이에 孝悌忠을 써 넣은 ‘仁義禮智孝悌忠信'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 효제를 忠과 信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부모 섬김, 웃어른 공경이 孝요, 동기간 우애와 화목이 悌(공경할 제)이다.
孝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판단을 넘어서는 본유적 윤리다. 悌는 친근함과 더불어 이뤄지는 덕목이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성이, 형제 간에는 우애가 바탕이 돼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기에 조선왕조 시대에는 효자각, 정려문을 지어 효자, 節女를 칭송하고 기렸다.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강릉의 미풍양속을 이렇게 찬탄했다.
“강릉대도호 풍속이 참으로 좋도다. 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널렸으니, 비옥가봉(比屋可封)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겠어라.”
비옥가봉은 ‘집마다 가히 표창할 만한 인물이 많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절효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우던 붉은 칠을 한 문이다. 정려문(旌閭門), 작설(綽楔), 홍문(紅門)이라고도 불리며, 보통 홍살문으로 궁궐, 관청, 향교, 능, 묘 앞에도 세운다. ‘忠(충)·孝(효)·烈(열)' 등의 글자를 새겨 포창(褒彰), 즉 공로나 선행의 종류를 표시하고 포창 받는 이의 이름이나 직함을 새겼다.
임경당뿐만 아니라 김주원공을 시조로 하는 강릉 김씨 문중에는 대를 이은 자랑스러운 효행 설화가 다수 전해진다. 예조참판 愛日堂 金光轍은 허균(1569~1618년)의 외증조부다. 이 집안 자손들이 보여준 삼대에 걸친 효도는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애일당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아깝다는 뜻에서 지어진 당호다. 김주원공의 22세손 金義亨은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 자신의 영달을 포기한 인물이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海運浦 萬戶였던 형 金仁元이 啓本改書사건으로 추국을 당하자 자신이 연루된 일이라 자초하여 오욕을 감수하고 형을 구해내는 悌의 모범을 보여줬다.
연천 홍석주(1774~1842년)는 ‘무명변(無命辯)'이라는 글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의(義)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명(命)이라고 했다. 오상과 관련 지어 말한다면 孝는 義의 범주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의는 단순히 옳다는 인식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에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하는 행동 윤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제는 의리다.
근래 사단법인 백교효문화선양회(이사장:권혁승)가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뿌리로서 효 사상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思母亭을 건립하고 효 사상 전파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나셨다. 살아생전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는 아들은 많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