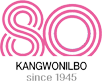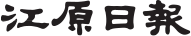몸은 수십㎞·수백㎞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고향에…
이번 설은 때때옷 입고 화상으로 덕담 나눠요
민초들 삶 속에서 명맥
질곡의 세월 견뎌낸 '설날'
80년 만에 되찾았는데…
코로나에 그리움만 삼켜
비대면 소통 낯설지만
가족의 환한 얼굴 보며
새해의 아쉬움 달래봐요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첫날인 '설'.
설은 나이를 헤아리는 말로 해석됩니다. '설'은 오늘날 '살'로 바뀐 나이를 부르는 정겨운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설날은 가족의 명절입니다. 새해 첫날의 의미를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덕담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조상을 숭배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며, 한없는 내리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80년 동안입니다. 무분별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제는 설을 구시대 유물로 낙인 찍고 그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양력 1월1일이 '신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 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정' 취급을 받아 왔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나이에 한 살을 더 얹는 것은 구정에 먹는 떡국에 의해서였습니다. 민초들의 삶 속에서 명맥을 이어 왔고, 질곡의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1989년 우리는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설 전후로 사흘간을 공휴일로 정해 새해의 시작을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사실 연휴를 사흘 일정으로 잡은 배경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에 맞게 북새통 교통난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80년 만에 어렵게 되찾은 설. 올해는 참 힘겹습니다. 때때옷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러 고향 길에 나선 발길을 올해 찾아보기 힘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행여나 손주 녀석 마당에서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하는 할아버지 걱정에 마당을 연신 쓸어 내던 빗자루는 창고에 보관 중이네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고기산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재잘거리는 손주들을 위해 들기름 옷을 입은 채 뜨거운 불을 견디던 솥뚜껑 역시 부엌에서 잠만 자고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뱃돈 봉투가 아른아른대는 아이들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자 고개를 떨굽니다.
마을 어귀에는 “애미야 어서와라, 설거지는 시애비가 다 해주마!”라는 정이 듬뿍 담긴 현수막 대신 '불효자는 '옵'니다'와 같은 조금은 살벌하면서도 애틋한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명절 최대 행사인 우리 마을 노래자랑을 위해 특설무대(?) 단골인 동네 시골학교는 굳게 잠긴 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무서운 문구로 겁을 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움만 삼킵니다.
하지만 설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단지 얼굴을 맞대고 세배하는 것만이 설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설을 되찾았듯, 우리의 설날 소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설날 소통은 여전히 어르신들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작디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등장하는 가족의 얼굴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비록 몸은 수십㎞, 수백㎞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19 안부를 묻는 걱정에 그 이상으로 가깝기만 합니다. 내년 설은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의 설의 아쉬움을 곱씹으며 '이겨내리라' 작은 다짐을 해 봅니다.
모두가 편하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명절이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인사는 어떤 방식이든지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