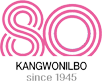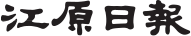“제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혹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먹기도 했으니 결코 청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를 펴시는데 누를 끼칠까 두려우니 저를 청백리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조선 명종 때인 1546년 4월10일 대사간 조사수의 진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종 임금의 판단은 분명했다. “어느 한 사람이 천거한 청덕(淸德)이 아니라, 조정이 다 함께 한 것이니 그 건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구원투수'로 낙점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과거 부적절했던 언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난 이후 행보도 조선시대 대사간 조사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참으로 염치없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귀를 막고 산다.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차갑다. 과연 그들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하는 정책을 펴 낼 수 있을까. ▼조선 세조 때 충청도 관노가 부친과 조부의 땅을 영의정 황수신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했다가 거꾸로 옥에 갇혔다. 조사에 나선 사헌부가 “황수신이 실제로 땅을 빼앗았다”고 보고했지만 세조는 “죄가 없으니 다시 거론 말라”고 했다. 사헌부가 “예·의·염·치(禮·義·廉·恥)의 네 가지 근본이 없으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며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니 진실로 두려운 것입니다”라며 그의 처벌을 재차 요청했지만 세조는 자신의 집권을 도운 공신이라는 점을 들어 황수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명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그만 써야 한다.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공자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왜 하는지 살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찰하면 어떻게 자기를 숨기겠는가?”라고 했다. 결국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관찰하면 답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이렇게 거른다면 최소한 알맹이와 쭉정이는 제대로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박종홍논설위원·pjh@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