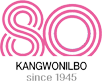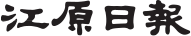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에는 늘 시원한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만, 이면에는 각종 재해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는 물과 함께 지내왔고,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물은 지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히면 돌아가고, 기울면 빠르게, 넓으면 느릿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다. 무엇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군주민수(君舟民水)'가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군자주야(君者舟也) 서인자수야(庶人者水也) 수즉재주(水則載舟) 수즉복주(水則覆舟)”라는 순자(荀子) 왕제편(王制篇)에서 따온 것이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므로, 물은 배를 띄우지만 때로는 배를 뒤집기도 한다. 백성은 권력자를 세우거나 돕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배가 물에게 조용히 따르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물 만난 고기'란 물과 고기의 상관성으로 생각해보면, 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 속성을 넘어서 의인화돼 민심을 투영한다.
조선의 숙종(肅宗)은 신하들에게 '호지벽상(湖之壁上), 염념불망(念念不忘)'을 적은 '주수도(舟水圖)'를 건네기도 했다. 이는 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벽 위에 걸어두고 늘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냐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 위에 배를 잘 띄울 것인지, 뒤엎어 버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백성의 몫이었다. 군주는 백성에 의해 권세를 얻었지만 또한 백성에 의해 권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 왔음을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경제적, 정치적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이념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므로 사람마다 이 결정과 다르다고 해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민심,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가 배를 띄우는 물로 비유돼 대변되기도 한다. 곧 선거 결과는 시대가 나아가야 할 정치와 삶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근래 들어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대화 및 협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춘천시의회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된 것은 협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제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和諧)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방관자의 자세를 지양해야만 한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을 뽑는다. 기초(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선출됐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출됐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물 위에 떠오른 '배'가 된 당선인들은 그동안 밝혀 온 수많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곧바로 시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라도 물(민심)이 다시 배를 뒤집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